문화


유병숙 작가
freshybs@hanmail.net
2024-02-07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열일곱 컬레 신발로 남은 엄마
'글. 유병숙'
신발장을 열었다. 달랑 두 식구 신발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남편보다 내 신발이 배는 많은 것 같다.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를 꺼내 든다. 펑퍼짐한 발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사들였던 걸까? 없앨까하다, 예쁘니 그냥 둬 볼까 망설인다. 이런 저런 핑계가 신발장을 채우고 있다.
엄마의 신발장이 생각났다. 유품을 정리하다 신발장을 열어보곤 깜짝 놀랐다. 무슨 신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 그나마 엄마를 졸라 낡은 건 정리해서 이 정도야. 엄마의 신발 심부름을 많이 했던 셋째가 거들었다.
밤색, 검정색, 회색 구두들은 하나같이 굽이 있었다. 당신의 작은 키를 굽으로 커버하려 했으리라. 단아한 모양새의 신발들은 여름용, 겨울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생뚱맞게 커다란 슬리퍼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국 사는 남동생 부부 몫이었다. 옆에 놓인 엄마의 슬리퍼가 왜소해 보였다.

리본 달린 구두가 보였다. 엄마에게 이런 구두가 다 있었네? 예쁘다며 들었다 놨다 하다 그예 장만하신거야. 엄마, 리본 달린 거 좋아하셨어. 신발마다 아직 엄마의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어릴 때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 몰래 빼딱 구두를 신어보려고 법석을 떨던 기억이 떠올랐다. 언니들 흉내 내다 막내가 넘어졌다. 우는 막내를 달래다 돌아보니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다. 한없이 커 보였던 신발은 실상 225mm에 지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 엄마는 옷 모양새나 색깔에 신발을 맞춰 신으려고 애를 썼다. 집안의 혼사를 앞두고 시장을 뒤져 굽 있는 고무신을 사오셨다. 외씨버선을 신은 엄마에게 잘 어울렸다. 동네에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이웃 아주머니들이 구경 왔다. 아버지는 멋 부리려다 넘어진다고 놀려댔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누구는 어울리지 않게 한복에 하이힐을 신고 왔다며 흉을 보기도 했다.
남매들의 신발 문수가 바뀔 때마다 무슨 신이 난 일이라도 생긴 듯 엄마는 우리를 앞세우고 동네 신발가게로 향했다. 키가 부쩍부쩍 크니 신발도 자주 바꿔 주어야 한다며 뜬금없이 자랑을 늘어놓았다. 가게 아주머니가 박신자 같은 농구 선수 되겠네 맞장구를 쳤다. 척척 신발을 바꾸어 주는 덕분에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다.
한 번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다니다가 혼이 났다. 새 신발을 산 지 몇 달 되지 않아 발이 또 커졌고 나는 또래보다 큰 발이 부끄러웠다. 신발이 불편할망정 예뻐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 급기야 운동화 엄지발가락 쪽이 뜯어졌다. 발이 편해야 만사가 잘 풀린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엄마가 사들이는 구두 굽이 뭉뚝해지기 시작했다. 아예 통굽을 사 오기도 했다. 예쁜 발에 어울리지 않는 납작한 신발들이 언짢았다. 어쩌다 생긴 구두표를 갖다 드려도 아버지 구두 먼저 장만하기 바빴다.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 신발들도 엄마의 신발을 닮아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225mm 어른 신발은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엄마 신발 한 번 사려면 사방으로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래서인지 당신의 신발을 애지중지하셨다. 파킨슨병에 함몰된 뒤로는 점점 보행이 어려워졌다. 신발도 신겨드려야 했다. 신발장을 열면 신지 못하는 엄마의 신발들이 사정도 모르고 얌전을 빼고 있었다. 집으로 오는 요양사가 마침 같은 싸이즈여서 신발 좀 드리자고 했더니 화를 내셨다. 다른 건 몰라도 한사코 신발만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답답하여 이 많은 걸 쟁여놓고 언제 신으려고 그래요? 묻자, 입을 우물거리다 나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아차, 싶었다. 엄마가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엄마의 몸이 차차 굳어졌다. 급기야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셨다. 그래도 엄마의 신발 타박은 멈추지 않았다. 더 편한 게 있을 것 같단다. 슬리퍼를 신고 병원에 가는 건 마다하셨다.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어린이용 실내화를 사서 신겨드렸다.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샌들처럼 생긴 실내화를 사 오란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병환 중에도 엄마의 눈썰미는 여전했다.

엄마의 신발들을 꺼내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다. 신발마다 새겨진 사연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신은 온 발에 착용하는 옷을 뜻한다. 원래는 구둣발, 버선발처럼 ‘신을 신은 발’을 가리켰다. 하지만 신(神)과 혼동하는 일을 우려해서 그런지 신발이란 말을 주로 쓰게 되었다. 엄마는 ‘신을 신은 발’을 신고 다시 걷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슴 저린 소망을 묵묵히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는 열일곱 컬레 신발을 남기셨다. 신발의 운명도 주인과 맥이 닿아있을지 모른다. 신발에는 엄마의 온 생을 싣고 항해했던 시간들이 알알이 박혀있었다.
EDITOR 편집팀
엄마의 신발장이 생각났다. 유품을 정리하다 신발장을 열어보곤 깜짝 놀랐다. 무슨 신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 그나마 엄마를 졸라 낡은 건 정리해서 이 정도야. 엄마의 신발 심부름을 많이 했던 셋째가 거들었다.
밤색, 검정색, 회색 구두들은 하나같이 굽이 있었다. 당신의 작은 키를 굽으로 커버하려 했으리라. 단아한 모양새의 신발들은 여름용, 겨울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생뚱맞게 커다란 슬리퍼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국 사는 남동생 부부 몫이었다. 옆에 놓인 엄마의 슬리퍼가 왜소해 보였다.

리본 달린 구두가 보였다. 엄마에게 이런 구두가 다 있었네? 예쁘다며 들었다 놨다 하다 그예 장만하신거야. 엄마, 리본 달린 거 좋아하셨어. 신발마다 아직 엄마의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어릴 때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 몰래 빼딱 구두를 신어보려고 법석을 떨던 기억이 떠올랐다. 언니들 흉내 내다 막내가 넘어졌다. 우는 막내를 달래다 돌아보니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다. 한없이 커 보였던 신발은 실상 225mm에 지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 엄마는 옷 모양새나 색깔에 신발을 맞춰 신으려고 애를 썼다. 집안의 혼사를 앞두고 시장을 뒤져 굽 있는 고무신을 사오셨다. 외씨버선을 신은 엄마에게 잘 어울렸다. 동네에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이웃 아주머니들이 구경 왔다. 아버지는 멋 부리려다 넘어진다고 놀려댔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누구는 어울리지 않게 한복에 하이힐을 신고 왔다며 흉을 보기도 했다.
남매들의 신발 문수가 바뀔 때마다 무슨 신이 난 일이라도 생긴 듯 엄마는 우리를 앞세우고 동네 신발가게로 향했다. 키가 부쩍부쩍 크니 신발도 자주 바꿔 주어야 한다며 뜬금없이 자랑을 늘어놓았다. 가게 아주머니가 박신자 같은 농구 선수 되겠네 맞장구를 쳤다. 척척 신발을 바꾸어 주는 덕분에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다.
한 번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다니다가 혼이 났다. 새 신발을 산 지 몇 달 되지 않아 발이 또 커졌고 나는 또래보다 큰 발이 부끄러웠다. 신발이 불편할망정 예뻐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 급기야 운동화 엄지발가락 쪽이 뜯어졌다. 발이 편해야 만사가 잘 풀린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엄마가 사들이는 구두 굽이 뭉뚝해지기 시작했다. 아예 통굽을 사 오기도 했다. 예쁜 발에 어울리지 않는 납작한 신발들이 언짢았다. 어쩌다 생긴 구두표를 갖다 드려도 아버지 구두 먼저 장만하기 바빴다.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 신발들도 엄마의 신발을 닮아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225mm 어른 신발은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엄마 신발 한 번 사려면 사방으로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래서인지 당신의 신발을 애지중지하셨다. 파킨슨병에 함몰된 뒤로는 점점 보행이 어려워졌다. 신발도 신겨드려야 했다. 신발장을 열면 신지 못하는 엄마의 신발들이 사정도 모르고 얌전을 빼고 있었다. 집으로 오는 요양사가 마침 같은 싸이즈여서 신발 좀 드리자고 했더니 화를 내셨다. 다른 건 몰라도 한사코 신발만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답답하여 이 많은 걸 쟁여놓고 언제 신으려고 그래요? 묻자, 입을 우물거리다 나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아차, 싶었다. 엄마가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엄마의 몸이 차차 굳어졌다. 급기야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셨다. 그래도 엄마의 신발 타박은 멈추지 않았다. 더 편한 게 있을 것 같단다. 슬리퍼를 신고 병원에 가는 건 마다하셨다.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어린이용 실내화를 사서 신겨드렸다.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샌들처럼 생긴 실내화를 사 오란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병환 중에도 엄마의 눈썰미는 여전했다.

엄마의 신발들을 꺼내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다. 신발마다 새겨진 사연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신은 온 발에 착용하는 옷을 뜻한다. 원래는 구둣발, 버선발처럼 ‘신을 신은 발’을 가리켰다. 하지만 신(神)과 혼동하는 일을 우려해서 그런지 신발이란 말을 주로 쓰게 되었다. 엄마는 ‘신을 신은 발’을 신고 다시 걷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슴 저린 소망을 묵묵히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는 열일곱 컬레 신발을 남기셨다. 신발의 운명도 주인과 맥이 닿아있을지 모른다. 신발에는 엄마의 온 생을 싣고 항해했던 시간들이 알알이 박혀있었다.

EDITOR 편집팀

유병숙 작가
이메일 : freshybs@hanmail.net
『책과 인생』 등단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4-24 08:47:07

-
2024-03-13 08:57:18

-
2024-02-07 08:58:24

-
2024-01-03 08:50:16

-
2023-11-29 09:01:54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02 09:13:43

-
2024-05-02 09:06:49

-
2024-04-30 08:51:35

-
2024-04-25 09: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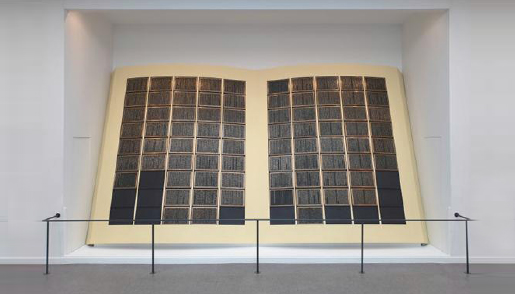
-
2024-04-24 08:4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