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병숙 작가
freshybs@hanmail.net
2024-01-03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눈으로 만지다
'글. 유병숙'
삐리리링! 친정집 번호키 풀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 열리기 무섭게 몸을 반쯤 일으키고 “누구야?” 묻던 어머니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마중 나올 것 같았다. “엄마, 나야, 나, 큰딸!” 자동으로 튀어나오던 대답을 꿀꺽 삼켰다. 어둠에 잠긴 거실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짙게 깔린 적막을 밀치고 얼른 전등을 켰다. 여전히 버티고 있는 어머니의 빈 침대가 서러웠다.
집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쓸모를 잃어버린 집기들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물건을 만질 때마다 숨어있던 소리가 엄니의 잔소리처럼 튀어나왔다.

베란다 입구를 막고 있는 베이지색 의자가 덩그러니 달떠 보인다. 의자는 엄니를 돌봐주던 요양사의 쉼터로 어머니의 요청으로 사들인 거였다. 어머니는 한동안 연세 지긋한 요양사와 언니, 동생 하며 지냈다.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리클라이너 의자에는 꽃방석이 놓여있다. 좁은데 또 무슨 의자냐고 말렸지만, 나이 든 사위가 방바닥에 앉는 게 안쓰럽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안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퀸사이즈 침대는 미국에서 방문할 아들 내외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도대체 이 집에 어머니가 쓰려고 사들인 물건이 있기나 한 걸까? 자리에 누우신 후 오롯이 당신 몫은 거실에 놓인 작은 침대와 약봉지가 수북한 탁자, 손 전화 충전기가 놓인 보조 탁자가 전부였다. 무겁다 하여 준비한 플라스틱 포크와 숟가락, 멜라민 식기, 플라스틱 컵이 최애 도구였다.
아직도 당신의 온기가 맴도는 주방으로 갔다. 가지런한 양념통들이 눈에 밟혔다. 우리만 보면 밥부터 챙기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다. 낡은 찬장에 쌓여있는 식기들을 꺼내 보았다. 접시 갈피마다 백지를 깔아두었다. 어머니의 찬찬한 살림 솜씨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다. 그릇을 들춰보다 문득 잔금이 가고 얼룩진 접시들을 발견했다. 애지중지하던 접시들의 색이 바래가고 있었다. 어릴 때 우리는 자주 이사 다녔다. 아버지는 은퇴 후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전부 털어 집을 장만했다. 기쁨도 잠시, 고혈압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유지가 깃든 집은 슬픈 기억으로 남았다. 홀로 된 어머니는 아들네를 따라 미국으로 살러 갔지만 이내 돌아오고 말았다. 학업이 한창인 손자들은 밖으로 돌았고, 아들 내외가 일터에 나간 후 멀거니 빈집을 지키고 있자니 못내 무료했으며, 낯선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가 무서웠단다. 운전하지 못하니 간혹 양념이 떨어져도 며느리가 마트에 가는 일요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신의 집으로 되돌아온 어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의류 공장, 버섯 공장 등에 취직하기도 했다.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산다며 남대문 시장, 경동 시장을 누비기도 했다.
칠순을 몇 해 앞두고 어머니는 두 여동생이 사는 일산에 정착했다. 둘째 딸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았고, 막내는 같은 동 위층에 살았다. 신이 난 어머니는 딸들을 위해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다. 손주들 보는 재미로, 일 나가는 막내네 집 돌보기로, 노인복지관 모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 어머니에게는 생활비 보내주는 아들이, 자주 드나드는 딸들이 자랑이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언제나 가고 싶은 호수공원’도 가까이에 있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내가 복이 많아서…. 네 아버지가 살아서 이 집을 봤어야 하는데…. 되뇌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은 주상복합이라 매우 시끄러웠다. 1층에는 부동산, 슈퍼마켓, 미용실, 가구점, 구두 수선집,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길 건너엔 건물마다 병원과 은행,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고, 종합병원도 가까이에 있었다. 사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 베란다 문을 열면 왕래하는 자동차 소음이 귀를 찔렀다. 앵앵거리는 구급차가 수시로 지나다녔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밤잠을 깨우기도 했다. “엄니, 시끄러워 어쩐대, 집을 옮겨야겠어요.” 몇 번을 권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정말이야. 너무 조용하면 멍한 게 답답해….” 하셨다.
뉴스에선 일인 가구가 늘어나 부지런히 짓고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 한다. 아이들도 장성하면 분가하는 세태요, 연로한 부모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세상이다.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 살겠다 선언했으니 어찌 보면 앞서신 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안테나는 늘 외로웠는지도 모른다. 걸리는 전파는 항상 자식이었다. 혼자 맛난 걸 먹으려면 목부터 멘다 했다. 불 켜지지 않은 집에 홀로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는 누구를 불렀을까?

호흡이 가빠지자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회가 자유롭지 않았다. 면회 때마다 어머니는 집에 언제 가냐고 물었다. 움직이기 힘드니 누워있는 침대째 집으로 가자고도 하셨다. 하나, 비위관을 삽입하고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한 어머니였다. 더는 집에서 병간호할 자신이 없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권했고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 아무래도 집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더 받읍시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에 못 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닌데….”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렇게 망연자실한 모습은 처음 뵈었다. 한참 후 어머니는 “자주 와! 너랑 동생들이랑, 번갈아 자주 와. 그러면 돼!” 하며 울먹였다. “알았어요. 엄마 꼭 그럴게요….”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에 누워 평상시 어머니가 그랬듯 TV를 시청하다 일어나 탁자에 밥상을 차려놓고 당신처럼 천천히 먹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가재도구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모두의 바람은 딱 하나, 어머니의 귀환이었다. 그랬다! 여긴 어머니의 왕국이다! 어머니의 기가 아직도 등등하게 느껴졌다. 나는 물기 촉촉한 눈으로 새삼 어머니의 보물들을 만지고 있었다.
EDITOR 편집팀
집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쓸모를 잃어버린 집기들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물건을 만질 때마다 숨어있던 소리가 엄니의 잔소리처럼 튀어나왔다.

베란다 입구를 막고 있는 베이지색 의자가 덩그러니 달떠 보인다. 의자는 엄니를 돌봐주던 요양사의 쉼터로 어머니의 요청으로 사들인 거였다. 어머니는 한동안 연세 지긋한 요양사와 언니, 동생 하며 지냈다.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리클라이너 의자에는 꽃방석이 놓여있다. 좁은데 또 무슨 의자냐고 말렸지만, 나이 든 사위가 방바닥에 앉는 게 안쓰럽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안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퀸사이즈 침대는 미국에서 방문할 아들 내외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도대체 이 집에 어머니가 쓰려고 사들인 물건이 있기나 한 걸까? 자리에 누우신 후 오롯이 당신 몫은 거실에 놓인 작은 침대와 약봉지가 수북한 탁자, 손 전화 충전기가 놓인 보조 탁자가 전부였다. 무겁다 하여 준비한 플라스틱 포크와 숟가락, 멜라민 식기, 플라스틱 컵이 최애 도구였다.
아직도 당신의 온기가 맴도는 주방으로 갔다. 가지런한 양념통들이 눈에 밟혔다. 우리만 보면 밥부터 챙기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다. 낡은 찬장에 쌓여있는 식기들을 꺼내 보았다. 접시 갈피마다 백지를 깔아두었다. 어머니의 찬찬한 살림 솜씨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다. 그릇을 들춰보다 문득 잔금이 가고 얼룩진 접시들을 발견했다. 애지중지하던 접시들의 색이 바래가고 있었다. 어릴 때 우리는 자주 이사 다녔다. 아버지는 은퇴 후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전부 털어 집을 장만했다. 기쁨도 잠시, 고혈압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유지가 깃든 집은 슬픈 기억으로 남았다. 홀로 된 어머니는 아들네를 따라 미국으로 살러 갔지만 이내 돌아오고 말았다. 학업이 한창인 손자들은 밖으로 돌았고, 아들 내외가 일터에 나간 후 멀거니 빈집을 지키고 있자니 못내 무료했으며, 낯선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가 무서웠단다. 운전하지 못하니 간혹 양념이 떨어져도 며느리가 마트에 가는 일요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신의 집으로 되돌아온 어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의류 공장, 버섯 공장 등에 취직하기도 했다.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산다며 남대문 시장, 경동 시장을 누비기도 했다.
칠순을 몇 해 앞두고 어머니는 두 여동생이 사는 일산에 정착했다. 둘째 딸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았고, 막내는 같은 동 위층에 살았다. 신이 난 어머니는 딸들을 위해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다. 손주들 보는 재미로, 일 나가는 막내네 집 돌보기로, 노인복지관 모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 어머니에게는 생활비 보내주는 아들이, 자주 드나드는 딸들이 자랑이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언제나 가고 싶은 호수공원’도 가까이에 있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내가 복이 많아서…. 네 아버지가 살아서 이 집을 봤어야 하는데…. 되뇌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은 주상복합이라 매우 시끄러웠다. 1층에는 부동산, 슈퍼마켓, 미용실, 가구점, 구두 수선집,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길 건너엔 건물마다 병원과 은행,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고, 종합병원도 가까이에 있었다. 사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 베란다 문을 열면 왕래하는 자동차 소음이 귀를 찔렀다. 앵앵거리는 구급차가 수시로 지나다녔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밤잠을 깨우기도 했다. “엄니, 시끄러워 어쩐대, 집을 옮겨야겠어요.” 몇 번을 권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정말이야. 너무 조용하면 멍한 게 답답해….” 하셨다.
뉴스에선 일인 가구가 늘어나 부지런히 짓고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 한다. 아이들도 장성하면 분가하는 세태요, 연로한 부모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세상이다.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 살겠다 선언했으니 어찌 보면 앞서신 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안테나는 늘 외로웠는지도 모른다. 걸리는 전파는 항상 자식이었다. 혼자 맛난 걸 먹으려면 목부터 멘다 했다. 불 켜지지 않은 집에 홀로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는 누구를 불렀을까?

호흡이 가빠지자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회가 자유롭지 않았다. 면회 때마다 어머니는 집에 언제 가냐고 물었다. 움직이기 힘드니 누워있는 침대째 집으로 가자고도 하셨다. 하나, 비위관을 삽입하고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한 어머니였다. 더는 집에서 병간호할 자신이 없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권했고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 아무래도 집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더 받읍시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에 못 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닌데….”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렇게 망연자실한 모습은 처음 뵈었다. 한참 후 어머니는 “자주 와! 너랑 동생들이랑, 번갈아 자주 와. 그러면 돼!” 하며 울먹였다. “알았어요. 엄마 꼭 그럴게요….”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에 누워 평상시 어머니가 그랬듯 TV를 시청하다 일어나 탁자에 밥상을 차려놓고 당신처럼 천천히 먹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가재도구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모두의 바람은 딱 하나, 어머니의 귀환이었다. 그랬다! 여긴 어머니의 왕국이다! 어머니의 기가 아직도 등등하게 느껴졌다. 나는 물기 촉촉한 눈으로 새삼 어머니의 보물들을 만지고 있었다.

EDITOR 편집팀

유병숙 작가
이메일 : freshybs@hanmail.net
『책과 인생』 등단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4-24 08:47:07

-
2024-03-13 08:57:18

-
2024-02-07 08:58:24

-
2024-01-03 08:50:16

-
2023-11-29 09:01:54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02 09:13:43

-
2024-05-02 09:06:49

-
2024-04-30 08:51:35

-
2024-04-25 09: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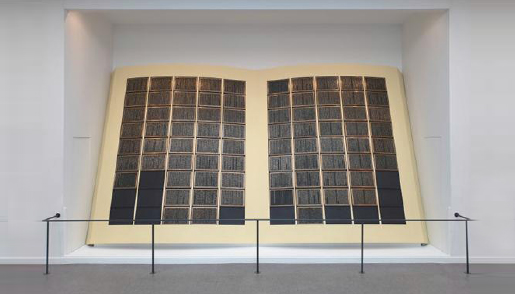
-
2024-04-24 08:4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