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병숙 작가
freshybs@hanmail.net
2023-11-29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길버트 그레이프처럼
'글. 유병숙'
아침 일찍부터 남동생과 조카는 캠핑카를 정돈하느라 분주했다. 옷가지와 식료품들을 싣고 있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굽은 등…. 녹록지 않았을 이국 살이가 읽혔다.
캠핑카는 버스만큼이나 컸다. 내부에는 침대, 거실, 주방, 냉장고, 샤워실, 화장실 등이 완비되어 있었다. 동생은 움직이는 집 한 채를 장만한 셈이었다. 캠핑카 구입에는 올케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 혹한과 밤이 지속되는 알래스카의 겨울은 세월이 갈수록 우울감을 더해주었다. 오랜 이민 생활에도 적응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본토로 내려갈 계획은 몇 년 뒤로 미뤄졌다.
오랜만에 사진을 정리하던 올케는 이민 초창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을 태우고 알래스카 구석구석을 여행 다니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상의 끝에 캠핑카를 장만했다. 동생 부부는 여행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다.

나에게 캠핑카의 로망을 심어주었던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감독: 라세 할스트룀)가 떠올랐다.
피터 헤지스의 소설 ‘What's Eating Gilbert Grape’(무엇이 길버트 그레이프를 갉아먹는가)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아이오와 주 ‘엔도라’라는 한적한 외딴 시골에 사는 그레이프 가족의 1978년도 이야기가 담겼다. ‘때론 부끄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란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길버트 그레이프(조니 뎁 분)는 다섯 남매의 차남으로 식료품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어머니(다렌 케이츠 분)는 남편의 자살에 충격을 받아 칩거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몸무게가 500파운드에 이르는 초고도비만자가 된다. 형은 대도시로 나간 지 오래고, 누나와 여동생은 저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 어니(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는 틈만 나면 높은 곳을 기어오르는 등 말썽을 부린다. 의사는 어니가 열 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어니의 열여덟 살 생일을 보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다. 캠핑족들이 마을에 들어온다. 부러운 눈길을 보내던 길버트는 가족과 엔도라로부터의 탈출을 꿈꾼다.
한편 캠핑족 소녀 베키(줄리엣 루이스 분)는 자동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엔도라에 머물게 되고, 우연히 가스탱크에 올라가 있는 어니에게 내려오라며 따스하게 독려하는 길버트에게 호감을 느낀다. 길버트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는 베키를 만나며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배운다.
생일을 앞둔 어니가 또 가스탱크에 오른다. 참다못한 경찰은 어니를 유치장에 가둔다. 어머니는 항의하려 7년 만에 외출을 감행한다. 무사히 어니를 데려오지만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수군댄다.
어니의 18세 생일날, 우여곡절 끝에 생일 파티가 열린다. 파티 후 어머니는 침대에서 잠자듯 숨을 거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매들은 집을 불태워 화장한다. 가족들은 더는 길버트에게 매달리지 않고 독립한다. 1년 후, 돌아온 베키의 캠핑카에 길버트와 어니가 올라탄다. 그토록 원했던 여행이 시작된다.

나는 TV로 이 영화를 만났다. 영화는 오 남매의 둘째 아들인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을 돌보는 등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 그이는 고충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 나는 시댁의 대소사를 맡아하며 동화되어 갔다.
무엇보다 화합이 우선시 되었다. 시댁의 수다한 식구들은 살아가는 방식과 개성이 제각각 달랐다. 그들은 주말마다 몰려와 먹고 마시며 집 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시누이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라고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화목하기 그지없어 보였으나 나는 늘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다. 젊은 나이에 집안일에 치여 살아가려니 가슴에 화증이 돋아났다. 무지개를 찾아왔으나, 가도 가도 무지개는 보이지 않았다.
친정아버지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렸다. 갓 미국으로 이주한 남동생은 발만 동동 굴렀다. 응급실로 실려 가실 때마다 허둥지둥 달려오는 여동생들이 애처로웠다. 네 남매의 맏이인 나는 아버지의 병원 뒷바라지와 친정의 대소사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때때로 압박감이 나를 눌러댔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병이 찾아들었다. 갑작스럽게 통증이 가슴을 죄어오면 호흡곤란이 일어났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시달렸다. 증상이 가라앉으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해 사흘여를 누워있어야 했다. 병원 순례에 나섰으나 좀처럼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국립의료원에 입원 해 마침내 부정맥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면밀히 관찰했다가 통증이 오면 무조건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 또한, 과도한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경고에 가까운 충고를 해왔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문득 영화의 장면들이 어른거렸다. 길버트의 처지와 내가 동일시되었다. ‘자신을 위해 바라는 건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한 거 말고.’ 베키의 대사가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진정 나는 내 인생을 누리고 있는 걸까?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베키와 길버트처럼 한곳에 매이지 않고 훌훌 떠돌 수 있다면 내 삶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후련했다. 캠핑카는 제도권을 벗어나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꿈꾸게 했다. 그즈음 우리나라에도 캠핑족 인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각은 굴뚝이었지만 실행에 옮길 여건도, 용기도 없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해지면 영화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뜻밖에 캠핑카를 만나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일시적으로나마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생도 나와 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낸 동생이 대견했다. “너,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축하해!” 계면쩍어하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캠핑카에 오르자 절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붕 시동이 걸렸다. 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EDITOR 편집팀
캠핑카는 버스만큼이나 컸다. 내부에는 침대, 거실, 주방, 냉장고, 샤워실, 화장실 등이 완비되어 있었다. 동생은 움직이는 집 한 채를 장만한 셈이었다. 캠핑카 구입에는 올케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 혹한과 밤이 지속되는 알래스카의 겨울은 세월이 갈수록 우울감을 더해주었다. 오랜 이민 생활에도 적응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본토로 내려갈 계획은 몇 년 뒤로 미뤄졌다.
오랜만에 사진을 정리하던 올케는 이민 초창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을 태우고 알래스카 구석구석을 여행 다니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상의 끝에 캠핑카를 장만했다. 동생 부부는 여행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다.

나에게 캠핑카의 로망을 심어주었던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감독: 라세 할스트룀)가 떠올랐다.
피터 헤지스의 소설 ‘What's Eating Gilbert Grape’(무엇이 길버트 그레이프를 갉아먹는가)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아이오와 주 ‘엔도라’라는 한적한 외딴 시골에 사는 그레이프 가족의 1978년도 이야기가 담겼다. ‘때론 부끄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란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길버트 그레이프(조니 뎁 분)는 다섯 남매의 차남으로 식료품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어머니(다렌 케이츠 분)는 남편의 자살에 충격을 받아 칩거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몸무게가 500파운드에 이르는 초고도비만자가 된다. 형은 대도시로 나간 지 오래고, 누나와 여동생은 저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 어니(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는 틈만 나면 높은 곳을 기어오르는 등 말썽을 부린다. 의사는 어니가 열 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어니의 열여덟 살 생일을 보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다. 캠핑족들이 마을에 들어온다. 부러운 눈길을 보내던 길버트는 가족과 엔도라로부터의 탈출을 꿈꾼다.
한편 캠핑족 소녀 베키(줄리엣 루이스 분)는 자동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엔도라에 머물게 되고, 우연히 가스탱크에 올라가 있는 어니에게 내려오라며 따스하게 독려하는 길버트에게 호감을 느낀다. 길버트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는 베키를 만나며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배운다.
생일을 앞둔 어니가 또 가스탱크에 오른다. 참다못한 경찰은 어니를 유치장에 가둔다. 어머니는 항의하려 7년 만에 외출을 감행한다. 무사히 어니를 데려오지만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수군댄다.
어니의 18세 생일날, 우여곡절 끝에 생일 파티가 열린다. 파티 후 어머니는 침대에서 잠자듯 숨을 거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매들은 집을 불태워 화장한다. 가족들은 더는 길버트에게 매달리지 않고 독립한다. 1년 후, 돌아온 베키의 캠핑카에 길버트와 어니가 올라탄다. 그토록 원했던 여행이 시작된다.

나는 TV로 이 영화를 만났다. 영화는 오 남매의 둘째 아들인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을 돌보는 등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 그이는 고충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 나는 시댁의 대소사를 맡아하며 동화되어 갔다.
무엇보다 화합이 우선시 되었다. 시댁의 수다한 식구들은 살아가는 방식과 개성이 제각각 달랐다. 그들은 주말마다 몰려와 먹고 마시며 집 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시누이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라고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화목하기 그지없어 보였으나 나는 늘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다. 젊은 나이에 집안일에 치여 살아가려니 가슴에 화증이 돋아났다. 무지개를 찾아왔으나, 가도 가도 무지개는 보이지 않았다.
친정아버지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렸다. 갓 미국으로 이주한 남동생은 발만 동동 굴렀다. 응급실로 실려 가실 때마다 허둥지둥 달려오는 여동생들이 애처로웠다. 네 남매의 맏이인 나는 아버지의 병원 뒷바라지와 친정의 대소사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때때로 압박감이 나를 눌러댔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병이 찾아들었다. 갑작스럽게 통증이 가슴을 죄어오면 호흡곤란이 일어났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시달렸다. 증상이 가라앉으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해 사흘여를 누워있어야 했다. 병원 순례에 나섰으나 좀처럼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국립의료원에 입원 해 마침내 부정맥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면밀히 관찰했다가 통증이 오면 무조건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 또한, 과도한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경고에 가까운 충고를 해왔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문득 영화의 장면들이 어른거렸다. 길버트의 처지와 내가 동일시되었다. ‘자신을 위해 바라는 건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한 거 말고.’ 베키의 대사가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진정 나는 내 인생을 누리고 있는 걸까?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베키와 길버트처럼 한곳에 매이지 않고 훌훌 떠돌 수 있다면 내 삶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후련했다. 캠핑카는 제도권을 벗어나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꿈꾸게 했다. 그즈음 우리나라에도 캠핑족 인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각은 굴뚝이었지만 실행에 옮길 여건도, 용기도 없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해지면 영화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뜻밖에 캠핑카를 만나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일시적으로나마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생도 나와 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낸 동생이 대견했다. “너,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축하해!” 계면쩍어하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캠핑카에 오르자 절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붕 시동이 걸렸다. 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EDITOR 편집팀

유병숙 작가
이메일 : freshybs@hanmail.net
『책과 인생』 등단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4-24 08:47:07

-
2024-03-13 08:57:18

-
2024-02-07 08:58:24

-
2024-01-03 08:50:16

-
2023-11-29 09:01:54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02 09:13:43

-
2024-05-02 09:06:49

-
2024-04-30 08:51:35

-
2024-04-25 09: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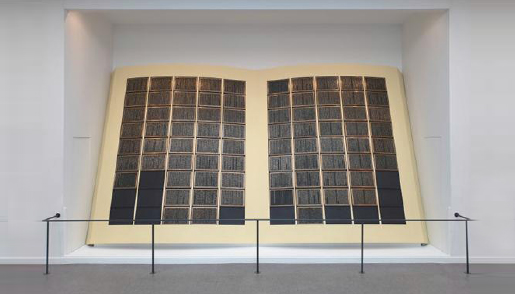
-
2024-04-24 08:4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