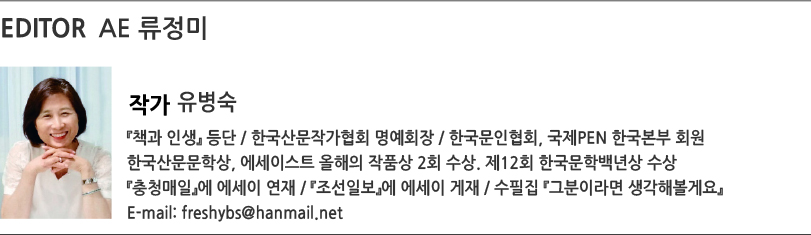문화


유병숙 작가
freshybs@hanmail.net
2023-07-12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불꽃을 켜다
'글. 유병숙'
어둠이 고인 집에 들어선다. 엄마가 남기고 간 체취가 사방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문득 탁자에 놓인 성모마리아 상에 눈길이 간다. 그 앞에 놓인 타다 남은 작은 초 두 개에는 촛농이 눌어붙어있다.
엄마는 새벽마다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올렸다.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며 기도하다 보면 아침이 밝더라고 하셨다. 종부성사도 받지 못한 채 떠난 엄마는 당신의 믿음대로 천당에 가셨을까?
엄마가 돌아가셨다. 향년 88세, 설날을 지낸 지 열하루 만이었다. 점심을 먹던 중 연락을 받고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눈은 누가 감겨드렸나? 주무시듯 떠나셨다 했다.
생의 마지막 설날, 요양원에서 당일 외출이 허락되어 엄마는 집으로 오셨다.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을 전전한 지 일 년 팔 개월 만이었다. 비위관을 제거한 엄마의 얼굴에 맑은 기운이 맴돌았다. 자손들이 모두 모이니 거실이 빼곡했다. 가족들을 눈에 담던 엄마는 몸이 아플 때는 세배를 받지 않는 거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엄마를 미소 짓게 한 건 증손자들이었다. 증손자들의 이마에 이마를 대보기도 하고 볼을 쓰다듬기도 했다. 엄마의 눈에 눈부처가 어렸다. 상황이 아이들을 의젓하게 만들었다. 왕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증손녀가 볼에 뽀뽀하자 함빡 웃으셨다. 고맙다, 고마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셨다.

며칠 후 병원 진료를 마친 엄마는 우리 세 자매와 하룻밤을 지냈다. 미음을 쑤어드렸더니 맛나게 드셨다. 주무시기 전 뜬금없이 언제 아버지 산소에 갔었냐고 물었다. 자주 들여다보라고도 하셨다. 오랜만에 당신 침대에 누우니 편안하다며 이내 깊은 잠에 드셨다. 아침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더니 엄마는 손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도 깨끗이 닦으라고 손짓하셨다. 엄마도 참, 깔끔한 성정은 여전하시네. 나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여 엄마를 간질이기 시작했다. 동생들이 합세하여 한바탕 웃었다. 서로 다투듯 엄마 곁에 누웠다. 막내는 버릇처럼 엄마의 젖가슴을 더듬으며 아휴, 엄마 냄새, 좋아! 했다. 둘째가 엄마 품에 코를 박으며 내 엄마야! 투정을 부렸다. 우리는 철부지로 돌아가 어리광을 부렸다. 어느새 젊어진 엄마가 웃고 있었다.
괴테는 임종 직전에 ‘조금 더, 더 밝은 빛을’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다. 해가 지기 전 노을이 더 짙고 선명하듯이 괴테는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욕망을 불태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질곡 많은 삶을 살아온 엄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간병하는 우리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요양원에 가서도 재활에 진척이 보인다며 희망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어느 날 정색하고 “나는 죽는 게 참 무서워. 죽기 싫어….” 하셨다.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죽으면 너희들도 못 보고, 손자들 결혼하는 것도 다 못 보고…. 이제 와 보니 너희와 살아온 날들이 다 아름다웠어. 힘들었던 건 다 없어지고 즐거웠던 일들만 자꾸 떠올라. 이걸 두고 떠나기 싫어. 너희 아버지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의 미련은 그저 우리를 두고 가는 거였다. “그래도 죽으면 천당에 가겠지? 성당에 열심히 다녔으니….” 하셨던 말씀이 내내 가슴을 울렸다.
초에 불을 붙인다. 불꽃이 타들어 가는 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본다. 엄마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새 초 몇 개를 더 찾아 불을 댕긴다. 불꽃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향초 타는 냄새가 코를 찔러댄다. 사방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마음이 안온해진다. 불꽃을 켜던 엄마는 가셨지만, 기도는 우리 곁에 남았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은다.
EDITOR AE류정미
엄마는 새벽마다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올렸다.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며 기도하다 보면 아침이 밝더라고 하셨다. 종부성사도 받지 못한 채 떠난 엄마는 당신의 믿음대로 천당에 가셨을까?
엄마가 돌아가셨다. 향년 88세, 설날을 지낸 지 열하루 만이었다. 점심을 먹던 중 연락을 받고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눈은 누가 감겨드렸나? 주무시듯 떠나셨다 했다.
생의 마지막 설날, 요양원에서 당일 외출이 허락되어 엄마는 집으로 오셨다.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을 전전한 지 일 년 팔 개월 만이었다. 비위관을 제거한 엄마의 얼굴에 맑은 기운이 맴돌았다. 자손들이 모두 모이니 거실이 빼곡했다. 가족들을 눈에 담던 엄마는 몸이 아플 때는 세배를 받지 않는 거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엄마를 미소 짓게 한 건 증손자들이었다. 증손자들의 이마에 이마를 대보기도 하고 볼을 쓰다듬기도 했다. 엄마의 눈에 눈부처가 어렸다. 상황이 아이들을 의젓하게 만들었다. 왕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증손녀가 볼에 뽀뽀하자 함빡 웃으셨다. 고맙다, 고마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셨다.

며칠 후 병원 진료를 마친 엄마는 우리 세 자매와 하룻밤을 지냈다. 미음을 쑤어드렸더니 맛나게 드셨다. 주무시기 전 뜬금없이 언제 아버지 산소에 갔었냐고 물었다. 자주 들여다보라고도 하셨다. 오랜만에 당신 침대에 누우니 편안하다며 이내 깊은 잠에 드셨다. 아침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더니 엄마는 손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도 깨끗이 닦으라고 손짓하셨다. 엄마도 참, 깔끔한 성정은 여전하시네. 나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여 엄마를 간질이기 시작했다. 동생들이 합세하여 한바탕 웃었다. 서로 다투듯 엄마 곁에 누웠다. 막내는 버릇처럼 엄마의 젖가슴을 더듬으며 아휴, 엄마 냄새, 좋아! 했다. 둘째가 엄마 품에 코를 박으며 내 엄마야! 투정을 부렸다. 우리는 철부지로 돌아가 어리광을 부렸다. 어느새 젊어진 엄마가 웃고 있었다.
괴테는 임종 직전에 ‘조금 더, 더 밝은 빛을’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다. 해가 지기 전 노을이 더 짙고 선명하듯이 괴테는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욕망을 불태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질곡 많은 삶을 살아온 엄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간병하는 우리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요양원에 가서도 재활에 진척이 보인다며 희망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어느 날 정색하고 “나는 죽는 게 참 무서워. 죽기 싫어….” 하셨다.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죽으면 너희들도 못 보고, 손자들 결혼하는 것도 다 못 보고…. 이제 와 보니 너희와 살아온 날들이 다 아름다웠어. 힘들었던 건 다 없어지고 즐거웠던 일들만 자꾸 떠올라. 이걸 두고 떠나기 싫어. 너희 아버지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의 미련은 그저 우리를 두고 가는 거였다. “그래도 죽으면 천당에 가겠지? 성당에 열심히 다녔으니….” 하셨던 말씀이 내내 가슴을 울렸다.
초에 불을 붙인다. 불꽃이 타들어 가는 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본다. 엄마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새 초 몇 개를 더 찾아 불을 댕긴다. 불꽃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향초 타는 냄새가 코를 찔러댄다. 사방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마음이 안온해진다. 불꽃을 켜던 엄마는 가셨지만, 기도는 우리 곁에 남았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은다.

EDITOR AE류정미

유병숙 작가
이메일 : freshybs@hanmail.net
『책과 인생』 등단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한국산문작가협회 명예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산문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 2회 수상
제12회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충청매일』에 에세이 연재
『조선일보』에 에세이 게재
수필집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4-24 08:47:07

-
2024-03-13 08:57:18

-
2024-02-07 08:58:24

-
2024-01-03 08:50:16

-
2023-11-29 09:01:54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16 09:03:27

-
2024-05-16 08:58:57

-
2024-05-10 08:59:03

-
2024-05-09 09:02:58

-
2024-05-08 08: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