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순철 작가
tlatks1026@hanmail.net
2023-04-12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엽편소설] 이럴 수가
'글. 박순철'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다.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핸드폰 액정화면에는 “선생님 왜 안 나오세요.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김♡영” 라는 문자가 선명하게 얼굴을 내민다. 누굴까? 하트 모양으로 봐선 여자가 분명했다. 의구심이 일었지만,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 문자 외에도 확인하지 않은 문자가 다섯 통이나 되었다.
하늘같이 믿어온 남편, 샛길로 빠지는 일 한번 없던 그이에게 요즘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전에는 내가 향수를 사다 줘도 본체도 않던 그이가 이제는 꼬박꼬박 향수를 뿌리고 출근하는 게 아닌가.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내가 확인을 하면 누가 보았다는 게 금방 탄로 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껏 지켜졌던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같이도 생각되어서였다.
“어 시원하다. 요새 웬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원….”
“그럼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실래요?”
“당신도 참, 내가 언제 집에서 술 먹는 것 봤어?”
샤워를 마친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분명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일 거다. 어쩌면 조금 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강타했지만 나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은 자정 가까이 되어서 돌아왔다. 자는 체하고 가만히 있자 남편은 조심조심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 지금 들어왔을까?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
“당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막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모르는 척 물어보았더니 돌아온 대답은 나를 더욱 기막히게 했다.
“응. 열한 시쯤 되었을 거야.”
“앞으론 좀 일찍 들어오세요. 수진이도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남편은 들었는지 아니면 못들은 체 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날도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서다. 나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한바탕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핸드폰이 없을 때도 공중전화로 늦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곧잘 전화했었다. 이제는 핸드폰이 있어도 받지도 않으니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내가 전화를 걸면 “오! 내 사랑”하고 감칠맛 나게 대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제는 눈치만 슬슬 보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마저 풍긴다. 오늘만 해도 나는 다섯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이웃 보기가 부끄러워서도 남편을 붙들고 다짜고짜 싸울 수는 없었다. 지금껏 숨죽이며 관리해온 내 이미지 ‘현모양처’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 핸드폰 고장 났어요. 이야길 하지 않고서요?”
남편도 양심은 있었던지 멀거니 바라보더니만
“핸드폰? 뭐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받지 않아요?”
“무슨 일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음, 전화했었어. 내가 보고 싶었었나 보네”
남편은 은근슬쩍 눙을 치며 나를 안으려 다가왔다.
“아니 이 양반이.”
나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을 밀어 박질렀다.
“무슨 짓이야?”
남편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뜬다.
“누군지 말 해봐요. 누구 만나서 놀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 문자를 본 것과 그다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자가 자주 들어왔었는데 그 모든 것을 총알 쏘듯 한꺼번에 쏘아댔다. 내가 퍼붓는 동안 입 한번 열지 않던 남편의 입가에 이상야릇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변해버린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현모양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부턴 다시 생각해야겠네. 그래, 그 문자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그날 현장에 나와 보시지 그랬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서재로 들어 가버린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혼자서는 싸울 수도 없었다.
차라리 어디 가서 놀다 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참아줄 수 있으련만, 남편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대화를 중단하고 서재에 들어앉고 말았다. 나를 악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서재까지 따라 들어가 싸울 만큼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튿날 남편에게 핸드폰을 다른 것으로 바꿔줄 테니 두고 출근하라고 했더니 두 말없이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 놓는다.

웬일일까? 남편의 핸드폰은 온종일 먹통이었다. 어쩌다 걸려오는 전화라는 게 ‘자금대출’이나 ‘상품선전’이 전부였다. 증거를 잡기는 틀린 일이었다. 이미 학교 전화로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알릴만한 사람에게는 알릴 시간이 충분해서일까.
퇴근 무렵이 되자 문제의 메시지가 다시 날아왔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김♡영”
나는 장난기 같은 야릇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약속장소가?”하고 답신 메시지를 날렸다.
“집 앞 푸른 카페라고 했잖아요.”
나는 옷을 대충 걸치고 푸른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곳에는 남편의 제자가 앉아 있다가 나를 발견하곤 얼른 일어선다. 집에도 가끔 데려오던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빼어났으나 우리 집을 너무 자주 들락거려 내가 눈총을 준 일도 있는 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있었다.
“사모님! 집에 들어가면 폐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아니, 좀 늦는다고 나보고 나가보라고 해서…”
“오빠! 인사드려. 선생님 사모님이셔”
앞에 앉아 있던 청년이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를 한다.
“차영 씨에게 많은 도움 주셨단 소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뒤통수가 부끄러워 그곳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결혼식 주례 맡아주겠다는 허락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학생의 소리가 자꾸만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EDITOR AE류정미
벌써 세 번째다.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핸드폰 액정화면에는 “선생님 왜 안 나오세요.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김♡영” 라는 문자가 선명하게 얼굴을 내민다. 누굴까? 하트 모양으로 봐선 여자가 분명했다. 의구심이 일었지만,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 문자 외에도 확인하지 않은 문자가 다섯 통이나 되었다.
하늘같이 믿어온 남편, 샛길로 빠지는 일 한번 없던 그이에게 요즘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전에는 내가 향수를 사다 줘도 본체도 않던 그이가 이제는 꼬박꼬박 향수를 뿌리고 출근하는 게 아닌가.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내가 확인을 하면 누가 보았다는 게 금방 탄로 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껏 지켜졌던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같이도 생각되어서였다.
“어 시원하다. 요새 웬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원….”
“그럼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실래요?”
“당신도 참, 내가 언제 집에서 술 먹는 것 봤어?”
샤워를 마친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분명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일 거다. 어쩌면 조금 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강타했지만 나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은 자정 가까이 되어서 돌아왔다. 자는 체하고 가만히 있자 남편은 조심조심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 지금 들어왔을까?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
“당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막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모르는 척 물어보았더니 돌아온 대답은 나를 더욱 기막히게 했다.
“응. 열한 시쯤 되었을 거야.”
“앞으론 좀 일찍 들어오세요. 수진이도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남편은 들었는지 아니면 못들은 체 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날도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서다. 나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한바탕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핸드폰이 없을 때도 공중전화로 늦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곧잘 전화했었다. 이제는 핸드폰이 있어도 받지도 않으니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내가 전화를 걸면 “오! 내 사랑”하고 감칠맛 나게 대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제는 눈치만 슬슬 보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마저 풍긴다. 오늘만 해도 나는 다섯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이웃 보기가 부끄러워서도 남편을 붙들고 다짜고짜 싸울 수는 없었다. 지금껏 숨죽이며 관리해온 내 이미지 ‘현모양처’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 핸드폰 고장 났어요. 이야길 하지 않고서요?”
남편도 양심은 있었던지 멀거니 바라보더니만
“핸드폰? 뭐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받지 않아요?”
“무슨 일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음, 전화했었어. 내가 보고 싶었었나 보네”
남편은 은근슬쩍 눙을 치며 나를 안으려 다가왔다.
“아니 이 양반이.”
나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을 밀어 박질렀다.
“무슨 짓이야?”
남편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뜬다.
“누군지 말 해봐요. 누구 만나서 놀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 문자를 본 것과 그다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자가 자주 들어왔었는데 그 모든 것을 총알 쏘듯 한꺼번에 쏘아댔다. 내가 퍼붓는 동안 입 한번 열지 않던 남편의 입가에 이상야릇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변해버린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현모양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부턴 다시 생각해야겠네. 그래, 그 문자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그날 현장에 나와 보시지 그랬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서재로 들어 가버린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혼자서는 싸울 수도 없었다.
차라리 어디 가서 놀다 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참아줄 수 있으련만, 남편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대화를 중단하고 서재에 들어앉고 말았다. 나를 악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서재까지 따라 들어가 싸울 만큼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튿날 남편에게 핸드폰을 다른 것으로 바꿔줄 테니 두고 출근하라고 했더니 두 말없이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 놓는다.

웬일일까? 남편의 핸드폰은 온종일 먹통이었다. 어쩌다 걸려오는 전화라는 게 ‘자금대출’이나 ‘상품선전’이 전부였다. 증거를 잡기는 틀린 일이었다. 이미 학교 전화로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알릴만한 사람에게는 알릴 시간이 충분해서일까.
퇴근 무렵이 되자 문제의 메시지가 다시 날아왔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김♡영”
나는 장난기 같은 야릇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약속장소가?”하고 답신 메시지를 날렸다.
“집 앞 푸른 카페라고 했잖아요.”
나는 옷을 대충 걸치고 푸른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곳에는 남편의 제자가 앉아 있다가 나를 발견하곤 얼른 일어선다. 집에도 가끔 데려오던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빼어났으나 우리 집을 너무 자주 들락거려 내가 눈총을 준 일도 있는 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있었다.
“사모님! 집에 들어가면 폐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아니, 좀 늦는다고 나보고 나가보라고 해서…”
“오빠! 인사드려. 선생님 사모님이셔”
앞에 앉아 있던 청년이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를 한다.
“차영 씨에게 많은 도움 주셨단 소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뒤통수가 부끄러워 그곳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결혼식 주례 맡아주겠다는 허락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학생의 소리가 자꾸만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EDITOR AE류정미

박순철 작가
이메일 : tlatks1026@hanmail.net
1994년 월간『수필문학』등단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3-27 08:55:39

-
2024-02-21 08:4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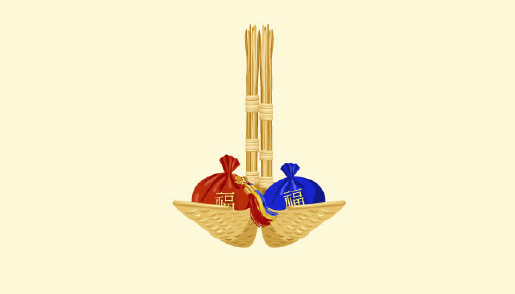
-
2024-01-17 09:09:29

-
2023-12-13 08:54:04

-
2023-11-08 08:51:03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16 09:03:27

-
2024-05-16 08:58:57

-
2024-05-10 08:59:03

-
2024-05-09 09:02:58

-
2024-05-08 08:4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