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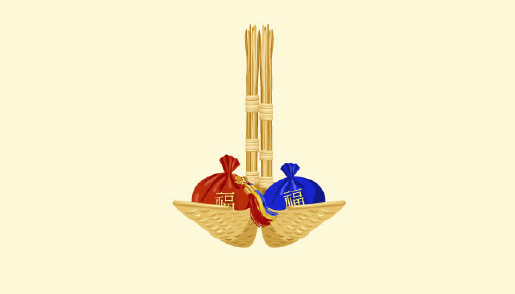

박순철 작가
tlatks1026@hanmail.net
2024-02-21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엽편 소설>
[엽편 소설] 복조리
'글. 박순철'
미명(未明)이 가시기도 전인 갑진년 새해 첫날, 벌써부터 일어나고 싶어도 곤히 자는 아내에게 정초부터 한 소리 들을까 봐 꼼지락꼼지락하는 소갈 씨! 그예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와 자신의 서재, 작은 골방으로 들어간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을 때 찾아드는 도피처다. 마음이 혼란할 때, 이 방에 들어와 자신의 감정을 삭이고 반성하는 곳이다. 이 방에 들어와 있으면 호랑이 같은 그의 아내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불러내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이다.
벽을 더듬어 불을 밝히자 화들짝 놀란 두 눈이 등잔만 하게 커진다. 새벽이면 항상 하는 염원(念願)이지만 오늘은 새해 첫날이어서 더욱 조신하다. ‘올 갑진년 한 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남의 입질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1인 손자 녀석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고 그저 마음껏 뛰놀게 해주십시오.’
소갈 씨는 무신론자이다. 그의 아내와 딸은 교회에 같이 다니자고 통사정했지만, 한마디로 거절했다. 적어도 종교에 관해서는 독불장군이다. 하지만 명승지나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사찰이 있으면 들러 대웅전 앞에 두 손 모으고 합장하는 예를 차린다. 어려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일종의 습관이다.
“덜커덩!”
무엇인가 대문 흔드는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일까? 나흘이나 되는 연휴에 신문이 올 리도 없고,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에 보이는 것은 우체통에 매달린 복조리였다. 지금도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구나 복조리 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손편지까지 들어있었다. 옛날에는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었다. 복조리를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 온다고 믿어온 우리 조상님들의 숭고한 토속신앙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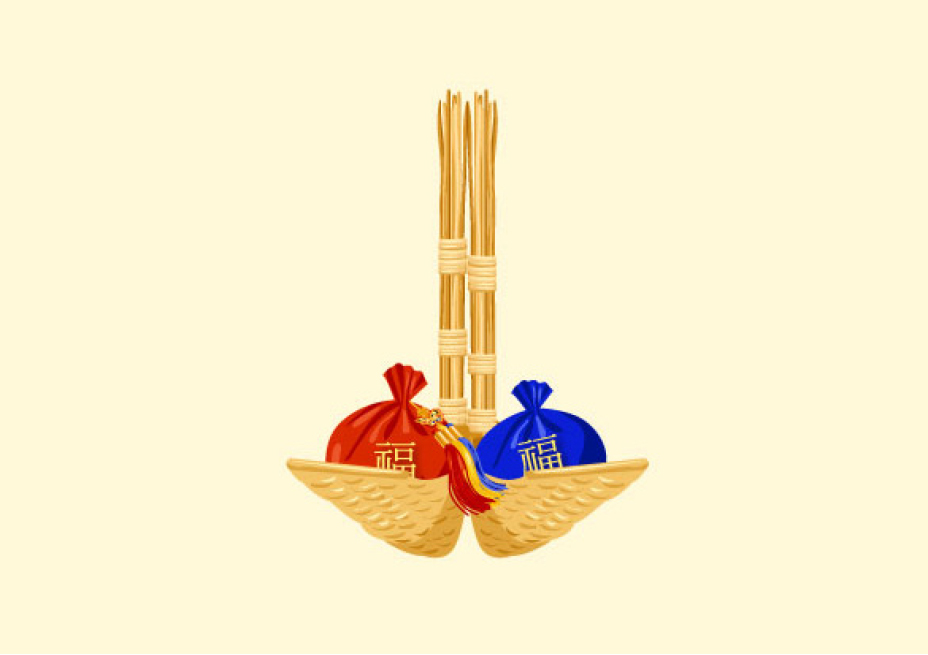
소갈 씨 고향은 산골 마을이다. 설이 다가오면 동네 어른들은 뒷산과 마을 강가에 지천으로 자라는 산죽을 베어다가 가늘게 쪼개어 복조리를 만들었다. 산죽의 굵기는 볼펜 굵기보다 약간 가늘어야 하고 반드시 그해에 돋은 가지여야 한다. 비를 맞으면 썩어서 재료로 쓰지 못할뿐더러 산죽 고유의 푸르스름한 빛을 잃어버린다. 초가을에 잘라다 말린 산죽은 네 가닥으로 쪼갠 다음 껍질을 벗기고 물에 하루 정도 담가 둔다. 그냥 사용하면 너무 뻣뻣해서 복조리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조리를 만드는 과정은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상당한 기술과 정성을 필요로 해서 젊은이들은 쉬이 만들지 못한다. 소갈 씨도 청년 시절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대들었다가 아까운 산죽만 못 쓰고 내버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농한기에 일거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다소 얼마간의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어른들은 힘을 모은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복조리를 청년들이 팔러 다녔다.
섣달그믐, 자정이 넘은 시각부터 초하루 새벽 사이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대문 안으로 던져놓는다. 만들어놓은 복조리가 많다 보니 동네에서 다 소비 못 하고 이웃 마을까지 다니면서 복조리를 팔아야 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날씨가 더 고약했다. 더구나 섣달그믐은 춥기가 고추보다 더 맵다는 소리가 있었다. 아마 입성이 지금처럼 변변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 싶다. 소갈 씨는 청년회장이 지정해주는 친구랑 짝을 이뤄 복조리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 이웃 동네에 갔다. 토끼털 귀마개를 한 모습을 지금 아이들이 보았다면 영락없이 TV에 나오는 영구 모습 같아서 배꼽을 잡고 웃어 넘어졌을지도 모른다.
“복 들어갑니다.”
“복조리요.”
동네에 다니면서 담 너머로 던져놓은 복조리 값은 이튿날 낮에 받으러 다녔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복조리에 복 많이 담아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풍년 농사 이루세요.”
“그런가? 고맙네.”

대부분 군말 없이 복조리 값을 주었고 복조리는 안방 문 앞이나 부엌 입구에 걸어놓고 그 안에 동전이나 엿을 넣어두었다. 엿은 액운을 막아주고, 동전은 금은보화가 굴러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넣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벌어들인 복조리 대금은 마을 기금으로 쓰고, 청년회에도 얼마간 배정되든 기억이 아련하다.
이곳 도시에 이사 나와서도 몇 해 동안은 복조리 파는 사람이 초하룻날 새벽에 다녀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시풍속마저 사라져서 아쉬운 마음 없지 않다. 지금은 조리를 쓸 일이 없지만, 소갈 씨가 복조리를 팔러 다니던 시절에는 마당에서 탈곡했기에 곡물에 불순물, 이를테면 작은 돌 조각이나 모래 같은 것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들은 쌀을 씻을 때 쌀이 담긴 바가지에 물을 붓고 조리로 노를 젓듯 일렁일렁해서 쌀을 건져 올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자잘한 돌멩이만 남았다. 조리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올 설 명절엔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인근 도시에 사는 아들을 집에 오지 말라 하고 쓸쓸하게 새해를 맞은 소갈 씨, 조상님 차례도 올리지 못하고 혼자 성묘만 다녀왔다. 침울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손자 녀석으로부터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언제 보아도 귀엽고 꼭 안아주고 싶은 녀석이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도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데 뒤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청주 도심의 철당간이 분명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손자가 최고다. 올해는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해지거라.”
“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복조리 받으셨어요?”
“복조리?”
“제가 할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 복조리 보냈어요. 조금 있으면 제 친구가 복조리 값 받으러 갈 거예요.”
“뭐야? 이 녀석, 이번에는 복조리로 할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허허허”
“할아버지! 복조리 값 조금만 주세요.”
“왜, 돈 필요하냐?”
“아니요. 친구들하고 복조리 팔아서 요양원 방문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사주지 않아요.”
“그럼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이리 가져오너라. 얼마나 되는지 할아버지가 다 사주마.”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고생하는 의미가 없어요. 팔지 못하는 것은 반납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오냐. 추운 데 고생이 많구나.”
그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소갈 씨!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로만 알았는데 이제 남을 위해 마음도 쓸 줄 아는 착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 같아 더없이 기뻤다.
‘올 갑진년은 잘 될 것 같아. 조짐이 좋아!’
우울해하던 소갈 씨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EDITOR 편집팀
벽을 더듬어 불을 밝히자 화들짝 놀란 두 눈이 등잔만 하게 커진다. 새벽이면 항상 하는 염원(念願)이지만 오늘은 새해 첫날이어서 더욱 조신하다. ‘올 갑진년 한 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남의 입질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1인 손자 녀석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고 그저 마음껏 뛰놀게 해주십시오.’
소갈 씨는 무신론자이다. 그의 아내와 딸은 교회에 같이 다니자고 통사정했지만, 한마디로 거절했다. 적어도 종교에 관해서는 독불장군이다. 하지만 명승지나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사찰이 있으면 들러 대웅전 앞에 두 손 모으고 합장하는 예를 차린다. 어려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일종의 습관이다.
“덜커덩!”
무엇인가 대문 흔드는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일까? 나흘이나 되는 연휴에 신문이 올 리도 없고,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에 보이는 것은 우체통에 매달린 복조리였다. 지금도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구나 복조리 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손편지까지 들어있었다. 옛날에는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었다. 복조리를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 온다고 믿어온 우리 조상님들의 숭고한 토속신앙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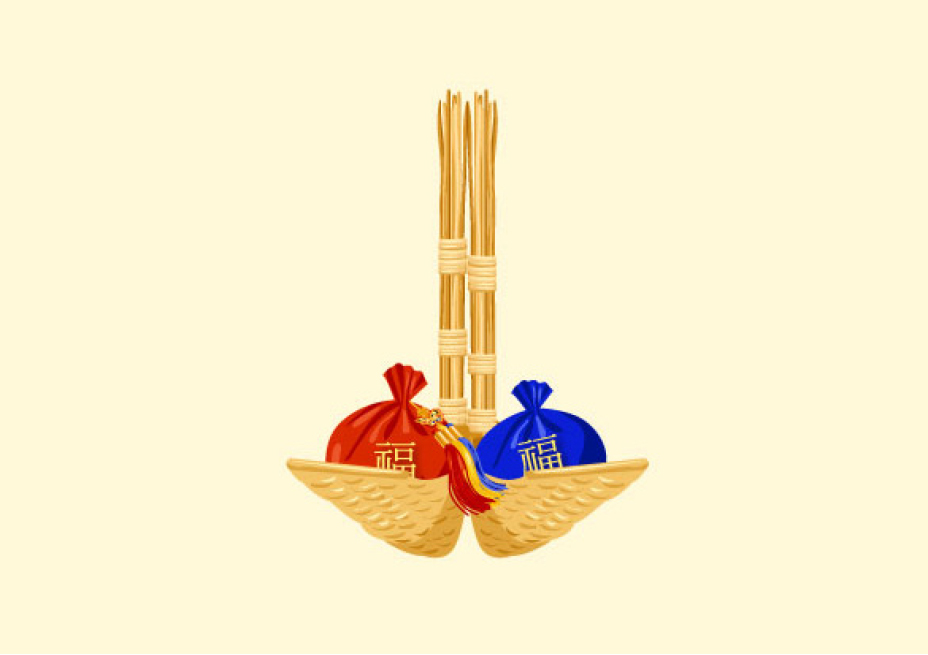
소갈 씨 고향은 산골 마을이다. 설이 다가오면 동네 어른들은 뒷산과 마을 강가에 지천으로 자라는 산죽을 베어다가 가늘게 쪼개어 복조리를 만들었다. 산죽의 굵기는 볼펜 굵기보다 약간 가늘어야 하고 반드시 그해에 돋은 가지여야 한다. 비를 맞으면 썩어서 재료로 쓰지 못할뿐더러 산죽 고유의 푸르스름한 빛을 잃어버린다. 초가을에 잘라다 말린 산죽은 네 가닥으로 쪼갠 다음 껍질을 벗기고 물에 하루 정도 담가 둔다. 그냥 사용하면 너무 뻣뻣해서 복조리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조리를 만드는 과정은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상당한 기술과 정성을 필요로 해서 젊은이들은 쉬이 만들지 못한다. 소갈 씨도 청년 시절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대들었다가 아까운 산죽만 못 쓰고 내버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농한기에 일거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다소 얼마간의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어른들은 힘을 모은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복조리를 청년들이 팔러 다녔다.
섣달그믐, 자정이 넘은 시각부터 초하루 새벽 사이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대문 안으로 던져놓는다. 만들어놓은 복조리가 많다 보니 동네에서 다 소비 못 하고 이웃 마을까지 다니면서 복조리를 팔아야 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날씨가 더 고약했다. 더구나 섣달그믐은 춥기가 고추보다 더 맵다는 소리가 있었다. 아마 입성이 지금처럼 변변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 싶다. 소갈 씨는 청년회장이 지정해주는 친구랑 짝을 이뤄 복조리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 이웃 동네에 갔다. 토끼털 귀마개를 한 모습을 지금 아이들이 보았다면 영락없이 TV에 나오는 영구 모습 같아서 배꼽을 잡고 웃어 넘어졌을지도 모른다.
“복 들어갑니다.”
“복조리요.”
동네에 다니면서 담 너머로 던져놓은 복조리 값은 이튿날 낮에 받으러 다녔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복조리에 복 많이 담아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풍년 농사 이루세요.”
“그런가? 고맙네.”

대부분 군말 없이 복조리 값을 주었고 복조리는 안방 문 앞이나 부엌 입구에 걸어놓고 그 안에 동전이나 엿을 넣어두었다. 엿은 액운을 막아주고, 동전은 금은보화가 굴러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넣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벌어들인 복조리 대금은 마을 기금으로 쓰고, 청년회에도 얼마간 배정되든 기억이 아련하다.
이곳 도시에 이사 나와서도 몇 해 동안은 복조리 파는 사람이 초하룻날 새벽에 다녀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시풍속마저 사라져서 아쉬운 마음 없지 않다. 지금은 조리를 쓸 일이 없지만, 소갈 씨가 복조리를 팔러 다니던 시절에는 마당에서 탈곡했기에 곡물에 불순물, 이를테면 작은 돌 조각이나 모래 같은 것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들은 쌀을 씻을 때 쌀이 담긴 바가지에 물을 붓고 조리로 노를 젓듯 일렁일렁해서 쌀을 건져 올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자잘한 돌멩이만 남았다. 조리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올 설 명절엔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인근 도시에 사는 아들을 집에 오지 말라 하고 쓸쓸하게 새해를 맞은 소갈 씨, 조상님 차례도 올리지 못하고 혼자 성묘만 다녀왔다. 침울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손자 녀석으로부터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언제 보아도 귀엽고 꼭 안아주고 싶은 녀석이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도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데 뒤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청주 도심의 철당간이 분명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손자가 최고다. 올해는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해지거라.”
“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복조리 받으셨어요?”
“복조리?”
“제가 할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 복조리 보냈어요. 조금 있으면 제 친구가 복조리 값 받으러 갈 거예요.”
“뭐야? 이 녀석, 이번에는 복조리로 할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허허허”
“할아버지! 복조리 값 조금만 주세요.”
“왜, 돈 필요하냐?”
“아니요. 친구들하고 복조리 팔아서 요양원 방문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사주지 않아요.”
“그럼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이리 가져오너라. 얼마나 되는지 할아버지가 다 사주마.”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고생하는 의미가 없어요. 팔지 못하는 것은 반납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오냐. 추운 데 고생이 많구나.”
그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소갈 씨!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로만 알았는데 이제 남을 위해 마음도 쓸 줄 아는 착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 같아 더없이 기뻤다.
‘올 갑진년은 잘 될 것 같아. 조짐이 좋아!’
우울해하던 소갈 씨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EDITOR 편집팀

박순철 작가
이메일 : tlatks1026@hanmail.net
1994년 월간『수필문학』등단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3-27 08:55:39

-
2024-02-21 08:4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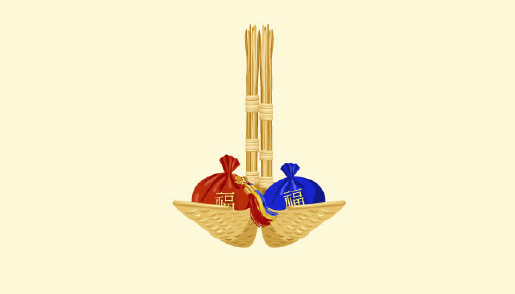
-
2024-01-17 09:09:29

-
2023-12-13 08:54:04

-
2023-11-08 08:51:03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10 08:59:03

-
2024-05-09 09:02:58

-
2024-05-08 08:48:18

-
2024-05-02 09:13:43

-
2024-05-02 09:0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