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순철 작가
tlatks1026@hanmail.net
2023-03-08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엽편소설] 결자해지
'글. 박순철'
“여보게 김 신(金 神) 어딜 가려고 그러나?”
“아들 네 집에 좀 가려고.”
“그 세상엔 뭣 하러? 좋은 꼴도 못 보고 오면서….”
계수나무 밑에 앉아있던 박 신(朴 神)과 오 신(吳 神)도 어슬렁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만두게. 가봐야 좋은 소식은커녕 가슴만 아플 걸세.”
“맞아.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내 살던 집에 가지 않을 작정이네. 인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골이 아프다네.”
잠자코 있던 오 신(吳 神)이 말참견하고 나섰다. 다른 신(神)들은 머리가 허연 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데 유독 오 신(吳 神)만은 새파란 청년의 모습이다. 인간 세계 같으면 아버지뻘, 또는 할아버지뻘 되는 다른 신(神)들에게 말을 놓고 있었다.
“그려 맞아, 나는 작년에 아들네 집에 가려다가 집을 못 찾아 얼마를 헤맸는지 모른다네.”
“왜, 다른 집으로 이사라도 했든가?”
“거,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 성냥갑 포개 놓은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영락없는 닭장이지 뭔가. 도무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이 신(神)아! 문패 같은 것도 없든가?”
제일 나중에 참석한 오 신(吳 神)이 히죽히죽 웃으며 재미있다는 듯 끼어든다.
“예끼, 못된 신(神) 같으니라고. 이래 봬도 인간 세상에선 대접받는 보통학교 훈장이었다. 내 제자만 해도 만 명은 넘을 거다. 이 신(神)아.”
“이런 신(神)하군. 그래 훈장을 했으면 뭘 하나. 이곳은 인간 세상과는 완전 다른 나라란 말일세.”
“잠자코 들어보세. 지금 인간 세상에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그 말이 맞네그려,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
이번에는 박 신(朴 神)이 중간에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그래서?”
“아! 글쎄 뼈 빠지게 농사지은 쌀로 떡을 해 갔었는데 첫소리가 뭔지 아나?”
“…….”
“‘해피야!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농사지은 쌀로 만든 떡이란다. 먹어보렴.’ 하면서 침대에 있는 강아지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닌가. 어이가 없더라구. 낳으라는 새끼는 낳지 않고 강아지를 자식처럼 대하는 꼴이라니. 졸지에 내가 개 할아버지가 되더라고 참으로 기가 막혀서….”
잠자코 듣고 있던 김 신(金 神)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요즘 애들 부모보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먼저야.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당했다네.”

김칠구 씨의 집은 시골 마을이었다. 칠구 씨 또한 아는 것이라곤 농사짓는 방법뿐이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살림날 때 겨우 변두리 전세 얻을 돈을 마련해준 게 전부였다. 그래도 심성 착한 큰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사했다. 그때의 기쁜 마음이란 말로 형언키 어려웠다.
둘째 아들은 맞이와는 달리 대학 공부시키느라 멀쩡하던 허리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정도였다. 졸업 후 국영기업체에 취직해서 예쁜 아내도 얻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두 내외가 올라가면 살갑게 대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번은 농사지은 고추, 고구마, 참깨 등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없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난감하기만 했다. 어렵게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이사 간 곳을 알아내기는 하였으나 영어로 된 아파트여서 도무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때 뒤에서 지껄이는 소리가 귀에 와 박혔다.
“요즘 젊은 사람들 시부모 못 찾아오게 하느라고 어려운 이름으로 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유행이여. 그걸 모르고 찾아온 사람이 참으로 불쌍하지. 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하는 어느 늙은이의 푸념이 들려왔다. 행여 자신의 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랐으나 이사한 지 1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자식이 괘씸하기만 했다. 가지고 갔던 콩이며 고구마를 관리사무소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으라고 주고 내려오고 말았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만나지도 않았어?”
“아니야,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나. 모른 체했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신(神)들이네. 요즘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하고 서울에 앉아서 일본 요리를 시켜 먹는 세상이란 말일세. 그러니 늙은이들 오는 게 거추장스럽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번에도 제일 젊은 오 신(吳 神)이 촐싹거리며 끼어들었다.
“뭐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신(神) 같으니라구.”
“거 말 잘했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신(神)은 그저 몽둥이찜질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저걸 그냥….”
그냥 두면 정말 한 대 때릴 기세다.
“자, 자, 그만 들 하세. 우리끼리 이러면 인간들이 웃을걸세. 그러지 말고 이보게. 오 신(吳 神)! 자네는 아직 이곳에 오기 아까운 나이인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리 일찍 오게 되었나?”
“머리 좋은 게 탈이었네. 젊은이들 돈 좀 늘려 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질질 울고 찾아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짭새들이 어찌나 따라붙는지….”
“꼭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꼬락서니가 여러 사람 울렸겠구먼,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보게.”
“빌라를 천여 채 가지고 있었어. 그때는 세월 참 좋았는데….”
“무자본으로 갭투자 해서 서민을 울린 그 빌라 왕?”
“그럼! 이거 수많은 젊은이를 울린 그 사기꾼 신(神)이잖아. 너 때문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젊은이가 몇인 줄 알기나 해?”
“세월이 좋았으면 일이 그렇게 꼬이지는 않았을걸세.”
“뭐야, 저런 사기만 치고 돌아다닌 신(神)하고 같이 있다간 우리 모두 같은 신(神) 되겠다. 저 신(神) 쫓아내 버리자.”
“아니다. 여봐라 저 젊은 신(神)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 주거라.”
언제 왔는지 하얀 수염이 석 자는 됨직한 옥황상제께서 측은한 듯 오 신(吳 神)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잡아다 놓으면 반성하고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옥황상제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너는 인간 세계로 가서 네 놈이 빼앗은 집을 모두 지어주거라. 밤낮으로 지으면 천년이면 지을 것이다. 사자(使者)는 저놈이 집을 다 지을 때까지 곁을 지키거라. 어서 떠나거라.”
철퇴를 든 검은 제복의 사자(使者)가 오 신(吳 神)을 옆구리에 끼고 푸른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EDITOR AE류정미
“아들 네 집에 좀 가려고.”
“그 세상엔 뭣 하러? 좋은 꼴도 못 보고 오면서….”
계수나무 밑에 앉아있던 박 신(朴 神)과 오 신(吳 神)도 어슬렁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만두게. 가봐야 좋은 소식은커녕 가슴만 아플 걸세.”
“맞아.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내 살던 집에 가지 않을 작정이네. 인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골이 아프다네.”
잠자코 있던 오 신(吳 神)이 말참견하고 나섰다. 다른 신(神)들은 머리가 허연 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데 유독 오 신(吳 神)만은 새파란 청년의 모습이다. 인간 세계 같으면 아버지뻘, 또는 할아버지뻘 되는 다른 신(神)들에게 말을 놓고 있었다.
“그려 맞아, 나는 작년에 아들네 집에 가려다가 집을 못 찾아 얼마를 헤맸는지 모른다네.”
“왜, 다른 집으로 이사라도 했든가?”
“거,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 성냥갑 포개 놓은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영락없는 닭장이지 뭔가. 도무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이 신(神)아! 문패 같은 것도 없든가?”
제일 나중에 참석한 오 신(吳 神)이 히죽히죽 웃으며 재미있다는 듯 끼어든다.
“예끼, 못된 신(神) 같으니라고. 이래 봬도 인간 세상에선 대접받는 보통학교 훈장이었다. 내 제자만 해도 만 명은 넘을 거다. 이 신(神)아.”
“이런 신(神)하군. 그래 훈장을 했으면 뭘 하나. 이곳은 인간 세상과는 완전 다른 나라란 말일세.”
“잠자코 들어보세. 지금 인간 세상에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그 말이 맞네그려,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
이번에는 박 신(朴 神)이 중간에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그래서?”
“아! 글쎄 뼈 빠지게 농사지은 쌀로 떡을 해 갔었는데 첫소리가 뭔지 아나?”
“…….”
“‘해피야!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농사지은 쌀로 만든 떡이란다. 먹어보렴.’ 하면서 침대에 있는 강아지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닌가. 어이가 없더라구. 낳으라는 새끼는 낳지 않고 강아지를 자식처럼 대하는 꼴이라니. 졸지에 내가 개 할아버지가 되더라고 참으로 기가 막혀서….”
잠자코 듣고 있던 김 신(金 神)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요즘 애들 부모보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먼저야.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당했다네.”

김칠구 씨의 집은 시골 마을이었다. 칠구 씨 또한 아는 것이라곤 농사짓는 방법뿐이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살림날 때 겨우 변두리 전세 얻을 돈을 마련해준 게 전부였다. 그래도 심성 착한 큰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사했다. 그때의 기쁜 마음이란 말로 형언키 어려웠다.
둘째 아들은 맞이와는 달리 대학 공부시키느라 멀쩡하던 허리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정도였다. 졸업 후 국영기업체에 취직해서 예쁜 아내도 얻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두 내외가 올라가면 살갑게 대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번은 농사지은 고추, 고구마, 참깨 등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없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난감하기만 했다. 어렵게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이사 간 곳을 알아내기는 하였으나 영어로 된 아파트여서 도무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때 뒤에서 지껄이는 소리가 귀에 와 박혔다.
“요즘 젊은 사람들 시부모 못 찾아오게 하느라고 어려운 이름으로 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유행이여. 그걸 모르고 찾아온 사람이 참으로 불쌍하지. 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하는 어느 늙은이의 푸념이 들려왔다. 행여 자신의 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랐으나 이사한 지 1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자식이 괘씸하기만 했다. 가지고 갔던 콩이며 고구마를 관리사무소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으라고 주고 내려오고 말았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만나지도 않았어?”
“아니야,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나. 모른 체했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신(神)들이네. 요즘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하고 서울에 앉아서 일본 요리를 시켜 먹는 세상이란 말일세. 그러니 늙은이들 오는 게 거추장스럽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번에도 제일 젊은 오 신(吳 神)이 촐싹거리며 끼어들었다.
“뭐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신(神) 같으니라구.”
“거 말 잘했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신(神)은 그저 몽둥이찜질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저걸 그냥….”
그냥 두면 정말 한 대 때릴 기세다.
“자, 자, 그만 들 하세. 우리끼리 이러면 인간들이 웃을걸세. 그러지 말고 이보게. 오 신(吳 神)! 자네는 아직 이곳에 오기 아까운 나이인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리 일찍 오게 되었나?”
“머리 좋은 게 탈이었네. 젊은이들 돈 좀 늘려 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질질 울고 찾아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짭새들이 어찌나 따라붙는지….”
“꼭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꼬락서니가 여러 사람 울렸겠구먼,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보게.”
“빌라를 천여 채 가지고 있었어. 그때는 세월 참 좋았는데….”
“무자본으로 갭투자 해서 서민을 울린 그 빌라 왕?”
“그럼! 이거 수많은 젊은이를 울린 그 사기꾼 신(神)이잖아. 너 때문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젊은이가 몇인 줄 알기나 해?”
“세월이 좋았으면 일이 그렇게 꼬이지는 않았을걸세.”
“뭐야, 저런 사기만 치고 돌아다닌 신(神)하고 같이 있다간 우리 모두 같은 신(神) 되겠다. 저 신(神) 쫓아내 버리자.”
“아니다. 여봐라 저 젊은 신(神)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 주거라.”
언제 왔는지 하얀 수염이 석 자는 됨직한 옥황상제께서 측은한 듯 오 신(吳 神)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잡아다 놓으면 반성하고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옥황상제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너는 인간 세계로 가서 네 놈이 빼앗은 집을 모두 지어주거라. 밤낮으로 지으면 천년이면 지을 것이다. 사자(使者)는 저놈이 집을 다 지을 때까지 곁을 지키거라. 어서 떠나거라.”
철퇴를 든 검은 제복의 사자(使者)가 오 신(吳 神)을 옆구리에 끼고 푸른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EDITOR AE류정미

박순철 작가
이메일 : tlatks1026@hanmail.net
1994년 월간『수필문학』등단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3-27 08:55:39

-
2024-02-21 08:4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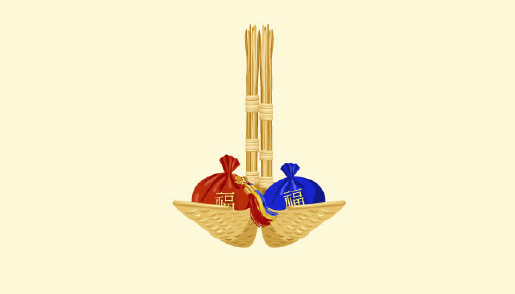
-
2024-01-17 09:09:29

-
2023-12-13 08:54:04

-
2023-11-08 08:51:03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16 09:03:27

-
2024-05-16 08:58:57

-
2024-05-10 08:59:03

-
2024-05-09 09:02:58

-
2024-05-08 08:4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