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순철 작가
tlatks1026@hanmail.net
2022-03-02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엽편 소설] 소갈머리
'글. 박순철'
소갈 씨가 빈 병을 자전거에 싣고 마트를 향해 내달린다. 언제부터인가 빈 병을 가지고 오면 100원씩 준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꺼번에 30개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고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에 대한 대비 아닐까 싶다. 마침 마트 로고가 새겨진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내가 보였다.
“빈 병 가지고 왔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지금 바빠서, 저쪽에 두고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소갈 씨는 남자직원이 시키는 데로 한쪽에 빈 병 상자를 내려놓고 계산대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빈 병 가져왔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에 두라고 해서 뒀어요.”
“잠깐만요.”
여직원이 밖으로 나오더니 소갈 씨를 불러 세웠다. 추워서 운동 갈 때 쓰는 방한모를 눌러쓰고, 버린다고 하는 아들이 입던 커다란 패딩점퍼를 걸친 소갈 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물이나 줍는 노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셀 수 있게 담아주셔야 해요.”
여직원은 소갈 씨가 내려놓은 상자에서 빈 병을 꺼내어 카트에 줄을 세워 담으며 소갈 씨에게도 하기를 바라는 명령조의 말이었다.
“뭐요? 그 일을 나 보고 하란 말입니까?”
조금 전 자신의 아래위를 훑어보며 고물 줍는 하찮은 늙은이로 생각했을 것이란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하는 여직원의 태도가 심히 못마땅했다. 여직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갈 씨를 바라본다. 고분고분 따를 줄 알았는데 대거리하는 늙은이가 마땅할 리 없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가져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빈 병 가져오지 말아야지.”
“가져오고 안 가져오는 것은 본인 의사지요.”
“그렇긴 하겠네요.”
소갈 씨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가지고 간 빈 병을 다시 집으로 싣고 온다는 것도 곤란하고 빈 병을 팔고 오는 것도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다음서부터는 가져오지 말아야지 하며 여직원과 같이 빈 병을 세워주는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이 병은 받지 않는데요.”
여직원이 병 하나를 들어 보이는데 음료수병이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도 어차피 버려야 할 것이니 이곳에서 처리해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쌀쌀맞기가 섣달그믐 오밤중 날씨는 말도 못 붙이겠다. 소갈 씨는 빈 병 가지고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돈 3천 원 때문에 이 수모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우선은 첫인상을 보지만 그다음은 그 사람의 입성을 보는 게 보통이다. 헌 옷이라도 깨끗하게 세탁하여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같은 옷이라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만, 아내는 밖에 나갈 때는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고 성화를 하는데 오늘도 집에서 입던 입성 그대로 나온 게 화근인지도 모르겠다.
지난여름에 동생이 시골에서 운영하는 민박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빈 소주병! 손님들이 가지고 와서 먹고 내놓은 것이라 했다. 한갓진 시골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청소차가 와야 싣고 간다고 했다. 마트에 가지고 가면 100원씩 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싣고 갔다 오는 기름값이 더 들어간다며 누가 가져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에 소갈 씨가 처리해주기로 마음먹고 가져온 것이다.
소갈 씨 집 부근에 고물상이 있어서 고물을 싣고 오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다. 대부분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었다. 그중에는 등이 굽거나 다리를 절룩거리는 노인도 있었다. 한번은 싸락눈을 맞으며 손수레 가득 폐지를 싣고 비척거리며 가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밀어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싣고가면 얼마나 받아요?”
“만 원도 못 받아요.” 하는 그 할머니의 답변에 가슴이 내려앉는 듯 답답함을 느꼈었다. 저 폐지를 줍기 위해서는 아마 몇 날 며칠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헤맸으리라. 만약, 자신이 고물상 사장이라면 넉넉하게 계산해 줄 것도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게 자명했다. 말로만 선진 복지국가이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까지 했다.
그런 노인들에게 빈 병 30개는 한나절 발품을 판 것만큼이나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져온 빈 병이 소갈 씨의 속을 뒤집어 놓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갈 씨가 분명하다.
소갈 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쌀과자 한 봉을 들고 나왔다. 조금 전 빈 병을 세던 여직원이 서 있는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3천 원인데요. 과잣값에 맞춰서 빈 병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쩌지요. 100원이 모자라서?….”사뭇 조롱하는 말투다.
“여기 있소.”
소갈 씨가 주머니를 뒤져 1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여직원의 눈이 새침해지는 것 같았다. 사실 주머니에 잔돈도 있었지만, 속이 꽁한 소갈 씨가 그예 그 잘난 소갈머리를 내보이고 말았다.
“미안해요. 잔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소갈 씨가 이번에는 점잖게 응수한다.
“상관없어요.”
소갈 씨가 빈 병 판 돈에 100원 보태서 산 쌀과자를 들고나오는데 며칠 전 폐지를 싣고 고물상으로 가던 할머니가 이번에는 빈 병을 싣고 마트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빈 병 팔러 오셨어요?”
“야, 누구신지?”
“저번에 뵈었어요. 할머니 이 과자 드세요.”
엉거주춤 서 있는 폐지 줍는 할머니 손에 과자를 들려주는 소갈 씨!
“아이고 얄궂어라. 생전 못 보던 분에게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유.”
할머니의 말을 못 들은 체 자전거를 타고 마트를 벗어나는 소갈 씨 등에 쌀쌀한 여직원의 눈길이 계속 따라붙고 있었다.
‘아휴 저 소갈머리 언제 고쳐지려나!’
EDITOR AE류정미
“빈 병 가지고 왔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지금 바빠서, 저쪽에 두고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소갈 씨는 남자직원이 시키는 데로 한쪽에 빈 병 상자를 내려놓고 계산대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빈 병 가져왔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에 두라고 해서 뒀어요.”
“잠깐만요.”
여직원이 밖으로 나오더니 소갈 씨를 불러 세웠다. 추워서 운동 갈 때 쓰는 방한모를 눌러쓰고, 버린다고 하는 아들이 입던 커다란 패딩점퍼를 걸친 소갈 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물이나 줍는 노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셀 수 있게 담아주셔야 해요.”
여직원은 소갈 씨가 내려놓은 상자에서 빈 병을 꺼내어 카트에 줄을 세워 담으며 소갈 씨에게도 하기를 바라는 명령조의 말이었다.
“뭐요? 그 일을 나 보고 하란 말입니까?”
조금 전 자신의 아래위를 훑어보며 고물 줍는 하찮은 늙은이로 생각했을 것이란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하는 여직원의 태도가 심히 못마땅했다. 여직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갈 씨를 바라본다. 고분고분 따를 줄 알았는데 대거리하는 늙은이가 마땅할 리 없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가져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빈 병 가져오지 말아야지.”
“가져오고 안 가져오는 것은 본인 의사지요.”
“그렇긴 하겠네요.”
소갈 씨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가지고 간 빈 병을 다시 집으로 싣고 온다는 것도 곤란하고 빈 병을 팔고 오는 것도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다음서부터는 가져오지 말아야지 하며 여직원과 같이 빈 병을 세워주는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이 병은 받지 않는데요.”
여직원이 병 하나를 들어 보이는데 음료수병이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도 어차피 버려야 할 것이니 이곳에서 처리해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쌀쌀맞기가 섣달그믐 오밤중 날씨는 말도 못 붙이겠다. 소갈 씨는 빈 병 가지고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돈 3천 원 때문에 이 수모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우선은 첫인상을 보지만 그다음은 그 사람의 입성을 보는 게 보통이다. 헌 옷이라도 깨끗하게 세탁하여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같은 옷이라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만, 아내는 밖에 나갈 때는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고 성화를 하는데 오늘도 집에서 입던 입성 그대로 나온 게 화근인지도 모르겠다.
지난여름에 동생이 시골에서 운영하는 민박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빈 소주병! 손님들이 가지고 와서 먹고 내놓은 것이라 했다. 한갓진 시골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청소차가 와야 싣고 간다고 했다. 마트에 가지고 가면 100원씩 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싣고 갔다 오는 기름값이 더 들어간다며 누가 가져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에 소갈 씨가 처리해주기로 마음먹고 가져온 것이다.
소갈 씨 집 부근에 고물상이 있어서 고물을 싣고 오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다. 대부분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었다. 그중에는 등이 굽거나 다리를 절룩거리는 노인도 있었다. 한번은 싸락눈을 맞으며 손수레 가득 폐지를 싣고 비척거리며 가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밀어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싣고가면 얼마나 받아요?”
“만 원도 못 받아요.” 하는 그 할머니의 답변에 가슴이 내려앉는 듯 답답함을 느꼈었다. 저 폐지를 줍기 위해서는 아마 몇 날 며칠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헤맸으리라. 만약, 자신이 고물상 사장이라면 넉넉하게 계산해 줄 것도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게 자명했다. 말로만 선진 복지국가이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까지 했다.
그런 노인들에게 빈 병 30개는 한나절 발품을 판 것만큼이나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져온 빈 병이 소갈 씨의 속을 뒤집어 놓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갈 씨가 분명하다.
소갈 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쌀과자 한 봉을 들고 나왔다. 조금 전 빈 병을 세던 여직원이 서 있는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3천 원인데요. 과잣값에 맞춰서 빈 병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쩌지요. 100원이 모자라서?….”사뭇 조롱하는 말투다.
“여기 있소.”
소갈 씨가 주머니를 뒤져 1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여직원의 눈이 새침해지는 것 같았다. 사실 주머니에 잔돈도 있었지만, 속이 꽁한 소갈 씨가 그예 그 잘난 소갈머리를 내보이고 말았다.
“미안해요. 잔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소갈 씨가 이번에는 점잖게 응수한다.
“상관없어요.”
소갈 씨가 빈 병 판 돈에 100원 보태서 산 쌀과자를 들고나오는데 며칠 전 폐지를 싣고 고물상으로 가던 할머니가 이번에는 빈 병을 싣고 마트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빈 병 팔러 오셨어요?”
“야, 누구신지?”
“저번에 뵈었어요. 할머니 이 과자 드세요.”
엉거주춤 서 있는 폐지 줍는 할머니 손에 과자를 들려주는 소갈 씨!
“아이고 얄궂어라. 생전 못 보던 분에게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유.”
할머니의 말을 못 들은 체 자전거를 타고 마트를 벗어나는 소갈 씨 등에 쌀쌀한 여직원의 눈길이 계속 따라붙고 있었다.
‘아휴 저 소갈머리 언제 고쳐지려나!’

EDITOR AE류정미

박순철 작가
이메일 : tlatks1026@hanmail.net
1994년 월간『수필문학』등단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3-27 08:55:39

-
2024-02-21 08:4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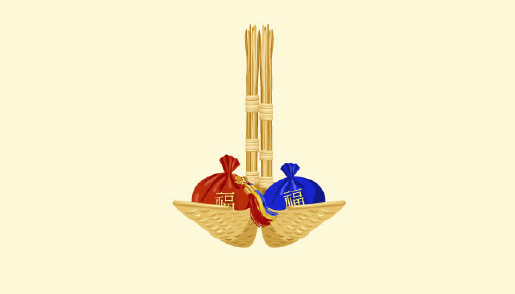
-
2024-01-17 09:09:29

-
2023-12-13 08:54:04

-
2023-11-08 08:51:03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16 09:03:27

-
2024-05-16 08:58:57

-
2024-05-10 08:59:03

-
2024-05-09 09:02:58

-
2024-05-08 08:4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