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순철 작가
tlatks1026@hanmail.net
2023-10-04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엽편 소설>
[엽편] 장손
'글. 박순철'
“아저씨 계신가요?”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이 나에게 꼭 존칭을 쓴다. 나는 그게 몹시 거북하고 불편하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찾아왔는지 궁금하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분명 벌초부터 시작해서 성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실 게 무척 많을 거다.
나는 밀양박씨 38대손으로 이곳 집성촌에선 장손으로 항렬이 높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세 많은 어른이 나를 찾아온다. 이름만 장손이지 아는 것도 없고 가문에 도움 되는 일도 하지 못한 나다. 성묘나 시월 묘사 때에는 꼭 나더러 제주를 하라고 해서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장손 자리 누구에게 주고 싶다. 솔직히 말해 축 쓰는 법도 읽을 줄도 모른다.

“꿇어앉으시오.”
“잔 올리고 두 번 절 하시오.”
이곳은 우리 집성촌이다 보니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친척이다. 지금 오신 조카뻘 되는 분은 슬하에 8남매를 두었는데 막내아들이 나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때는 조·손간에 싸움질도 더러 하고 냇가에서 발가벗고 목욕도 같이하며 자랐다.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1년에 두어 번 만난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서로 하대를 하지만 누가 있으면 나에게 꼭 존칭을 쓴다. 나는 그런 게 무척 싫다. 그저 편하게 살고 싶다.
아버지가 더 사셨어야 했는데 어쩌자고 아버지는 이 거추장스러운 장손 자리 일찌감치 물려주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3대 독자였고 나 또한 4대 독자다. 다행히도 나는 아들을 둘이나 두었으니 독자는 면하게 생겼다.
“앉으세요. 저를 부르지 않으시고요?”
“아이고, 그 무슨 말씀을, 우리 집안이 이래도 옛날에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아, 또 그 양반 타령! 머리가 돌 것 같다. 조상님들이 이런 망나니 같은 자손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용하다고 할 정도다.
“아저씨! 이번 벌초에는 돈을 좀 써야겠습니다. 양지말 육촌 형님이랑 이야기했는데 벌초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말은 안 해도 젊은 사람들이 기계를 안 지려고 한다네요. 그래서 벌초 때 기계를 가지고 나오거나 같이 풀을 깎는 사람에게는 목욕이나 하라고 1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데 아저씨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시지요. 날은 덥고 기계질 하려면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언제나 그랬다. 내가 장손이면 뭐 하겠는가. 모든 권한은 종중에 있다. 어른들이 모여서 결의가 되면 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장손이니 속된말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른들 하시는 일이 하나도 그른 게 없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어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예도 있었다. 음지말 조카님이 와서 한식 때 6대조 할아버지 사초 할 적에 옆 산소 9대조 할아버지 산소에도 잔디를 입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하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좀실 형님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였다. 이미 대답을 했으니 내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결국,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두 산소 모두 사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어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 종중은 다른 집안에 비해 종중 재산이 좀 있는 편이다. 선대부터 내려오던 마을 앞산이 우리 산이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림 산으로 종중에서 관리하며 땔나무를 그곳에서 얻었다고 했다.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공급되고, 석유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 종중 산도 숨을 쉬었다고 했다. 점차 숲도 우거지고 차츰 아름드리나무도 벌목하게 되어 가난한 농부들의 집안에 보탬이 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행정수도가 인근으로 내려오기로 결정된 다음이었다. 우리 산을 거치지 않고는 구불구불한 옛길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 우리 산은 도로에 편입되고 그 보상금이 만만찮았다.
산 전체 면적이 15정보인데 그 중 편입된 면적이 절반 정도라고 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러했다. 당시 시세보다 월등 높은 보상금이 나왔다. 당시는 은행이자가 높을 때여서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하면 찾아서 쓰곤 했다.
지금도 기억에 있는 것은 강 건너 좀실 조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 종중에서는 큰 경사라며 잔치를 벌이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나는 지방 대학에서도 떨어져 부모님 뵙기가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다. 어찌어찌 간신히 2년제 대학을 졸업하긴 했으나 그 졸업장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아버지를 도와 농사에 전념하는 장손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지금도 자금이 몇억 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관심 밖의 일이다. 그 돈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노인들이 어떻게나 단속을 잘하는지 누가 일 원 한 장 넘볼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벌초하는데 목욕비를 지급하겠다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일할 만한 사람은 나보다 촌수가 낮지만, 나이는 나와 비슷하다. ‘그 돈 뒀다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쟁여두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는 화장하자고 하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예취기 짊어지고 나오는 사람은 고향마을에 있는 사람이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 내미는 사람들은 기계질도 할 줄 모른다. 젊은 사람이면 그만한 힘이야 있겠지만, 기계는 다뤄본 사람이 다루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수고한 사람에게 목욕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몇 년 전부터는 벌초하는 날은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술도 넉넉하게 사들인다. 집안 여인들이 모여서 음식 장만하고 잔칫집 분위기다. 그날 구워 먹고 남는 고기는 봉송 싸듯 싸서 하나씩 들려 보내면 모두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질하는 사람에게 목욕비까지 지급하겠다니 어른들 생각이 많이 변한 거다.
내 생각은 성묘 오는 사람에게도 여비를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 조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분들에게 예를 차리러 오는 사람에게 여비를 주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다. 가령 서울은 10만 원, 부산은 15만 원, 그러면 조상님께 인사 올려서 좋고, 고향에 들러서 좋고, 또 여비까지 받아가니 여간 좋겠는가. 종중에 돈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 이자만 가져도 벌초하고 모든 경비 쓰고도 남는다고 한다.
어른들 말씀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장손이면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아, 이 장손 가져갈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EDITOR 편집팀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이 나에게 꼭 존칭을 쓴다. 나는 그게 몹시 거북하고 불편하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찾아왔는지 궁금하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분명 벌초부터 시작해서 성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실 게 무척 많을 거다.
나는 밀양박씨 38대손으로 이곳 집성촌에선 장손으로 항렬이 높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세 많은 어른이 나를 찾아온다. 이름만 장손이지 아는 것도 없고 가문에 도움 되는 일도 하지 못한 나다. 성묘나 시월 묘사 때에는 꼭 나더러 제주를 하라고 해서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장손 자리 누구에게 주고 싶다. 솔직히 말해 축 쓰는 법도 읽을 줄도 모른다.

“꿇어앉으시오.”
“잔 올리고 두 번 절 하시오.”
이곳은 우리 집성촌이다 보니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친척이다. 지금 오신 조카뻘 되는 분은 슬하에 8남매를 두었는데 막내아들이 나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때는 조·손간에 싸움질도 더러 하고 냇가에서 발가벗고 목욕도 같이하며 자랐다.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1년에 두어 번 만난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서로 하대를 하지만 누가 있으면 나에게 꼭 존칭을 쓴다. 나는 그런 게 무척 싫다. 그저 편하게 살고 싶다.
아버지가 더 사셨어야 했는데 어쩌자고 아버지는 이 거추장스러운 장손 자리 일찌감치 물려주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3대 독자였고 나 또한 4대 독자다. 다행히도 나는 아들을 둘이나 두었으니 독자는 면하게 생겼다.
“앉으세요. 저를 부르지 않으시고요?”
“아이고, 그 무슨 말씀을, 우리 집안이 이래도 옛날에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아, 또 그 양반 타령! 머리가 돌 것 같다. 조상님들이 이런 망나니 같은 자손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용하다고 할 정도다.
“아저씨! 이번 벌초에는 돈을 좀 써야겠습니다. 양지말 육촌 형님이랑 이야기했는데 벌초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말은 안 해도 젊은 사람들이 기계를 안 지려고 한다네요. 그래서 벌초 때 기계를 가지고 나오거나 같이 풀을 깎는 사람에게는 목욕이나 하라고 1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데 아저씨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시지요. 날은 덥고 기계질 하려면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언제나 그랬다. 내가 장손이면 뭐 하겠는가. 모든 권한은 종중에 있다. 어른들이 모여서 결의가 되면 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장손이니 속된말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른들 하시는 일이 하나도 그른 게 없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어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예도 있었다. 음지말 조카님이 와서 한식 때 6대조 할아버지 사초 할 적에 옆 산소 9대조 할아버지 산소에도 잔디를 입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하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좀실 형님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였다. 이미 대답을 했으니 내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결국,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두 산소 모두 사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어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 종중은 다른 집안에 비해 종중 재산이 좀 있는 편이다. 선대부터 내려오던 마을 앞산이 우리 산이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림 산으로 종중에서 관리하며 땔나무를 그곳에서 얻었다고 했다.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공급되고, 석유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 종중 산도 숨을 쉬었다고 했다. 점차 숲도 우거지고 차츰 아름드리나무도 벌목하게 되어 가난한 농부들의 집안에 보탬이 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행정수도가 인근으로 내려오기로 결정된 다음이었다. 우리 산을 거치지 않고는 구불구불한 옛길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 우리 산은 도로에 편입되고 그 보상금이 만만찮았다.
산 전체 면적이 15정보인데 그 중 편입된 면적이 절반 정도라고 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러했다. 당시 시세보다 월등 높은 보상금이 나왔다. 당시는 은행이자가 높을 때여서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하면 찾아서 쓰곤 했다.
지금도 기억에 있는 것은 강 건너 좀실 조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 종중에서는 큰 경사라며 잔치를 벌이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나는 지방 대학에서도 떨어져 부모님 뵙기가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다. 어찌어찌 간신히 2년제 대학을 졸업하긴 했으나 그 졸업장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아버지를 도와 농사에 전념하는 장손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지금도 자금이 몇억 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관심 밖의 일이다. 그 돈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노인들이 어떻게나 단속을 잘하는지 누가 일 원 한 장 넘볼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벌초하는데 목욕비를 지급하겠다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일할 만한 사람은 나보다 촌수가 낮지만, 나이는 나와 비슷하다. ‘그 돈 뒀다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쟁여두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는 화장하자고 하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예취기 짊어지고 나오는 사람은 고향마을에 있는 사람이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 내미는 사람들은 기계질도 할 줄 모른다. 젊은 사람이면 그만한 힘이야 있겠지만, 기계는 다뤄본 사람이 다루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수고한 사람에게 목욕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몇 년 전부터는 벌초하는 날은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술도 넉넉하게 사들인다. 집안 여인들이 모여서 음식 장만하고 잔칫집 분위기다. 그날 구워 먹고 남는 고기는 봉송 싸듯 싸서 하나씩 들려 보내면 모두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질하는 사람에게 목욕비까지 지급하겠다니 어른들 생각이 많이 변한 거다.
내 생각은 성묘 오는 사람에게도 여비를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 조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분들에게 예를 차리러 오는 사람에게 여비를 주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다. 가령 서울은 10만 원, 부산은 15만 원, 그러면 조상님께 인사 올려서 좋고, 고향에 들러서 좋고, 또 여비까지 받아가니 여간 좋겠는가. 종중에 돈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 이자만 가져도 벌초하고 모든 경비 쓰고도 남는다고 한다.
어른들 말씀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장손이면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아, 이 장손 가져갈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EDITOR 편집팀

박순철 작가
이메일 : tlatks1026@hanmail.net
1994년 월간『수필문학』등단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현)
중부매일『에세이뜨락』연재(2008∼2011)
충북일보『에세이뜨락』연재(2012∼2013)
충청매일 콩트 연재 (2015∼2018)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깨우지 마세요』
콩트집 『소갈 씨』
엽편소설집『목격자』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3-27 08:55:39

-
2024-02-21 08:4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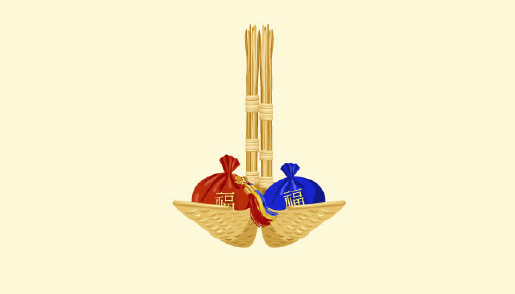
-
2024-01-17 09:09:29

-
2023-12-13 08:54:04

-
2023-11-08 08:51:03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5-16 09:03:27

-
2024-05-16 08:58:57

-
2024-05-10 08:59:03

-
2024-05-09 09:02:58

-
2024-05-08 08:48:18




